한국 최고 석학들의 고증이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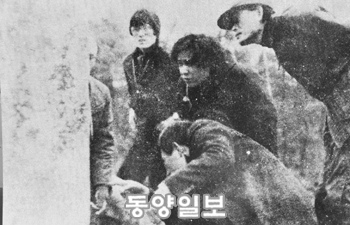
한국 최고 석학들의 고증이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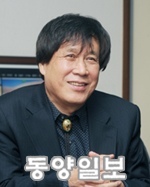
탁본이 완료될 무렵 봉황리마애불상군에 다녀온 황 박사 일행과 합류해 충주시내 충인동에 소재한 다방으로 갔다. 필자도 약혼식이 끝나 여기서 합류, 다방 병풍에 정 박사가 가져온 탁본을 걸치고 상세히 살펴보는데 황 박사는 이미 이 비의 중요성을 간파하신 듯 갈증을 참을 수 없어 거듭 차를 주문해 우리들을 긴장시켰다. 황 박사는 이 비를 진흥대왕의 순수비로 추정했다. 비문의 서두를 ‘진흥대왕’으로 판독하고 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다. 이 비석은 당초부터 高麗大王을 眞興大王으로 판독할 만큼 마멸이 심한, 미스테리로 가득한 금석문이었다. 황 박사는 이 비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정영호 관장에게 하명하시고 일행은 귀경했다.
이틀 후인 4월 7일 오후, 단국대박물관에서는 교수·조교·학생 등 27명의 대규모 학술조사단을 편성해 충주 입석마을에 도착했다. 정영호관장의 지휘로 비석에 더운물을 부어가면서 나무젓가락과 칫솔 등을 이용하여 정성스럽게 비석 전체에 덮힌 이끼와 청태 등을 제거했다. 다음날인 8일 오전부터 불순물제거작업과 병행해 탁본을 했고, 완료된 탁본은 방안의 벽면에 걸어놓고 여러 학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씩 판독에 들어갔다. 한자·한획을 놓고도 여러 갈래의 이견들이 있었고 한자 한 획에 여러 학자들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종이에 기록하는 난해한 작업이 아침부터 지루하게 계속 됐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도 비석의 국적은 물론 정체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다 그만큼 마멸이 심한 원인도 있지만 ‘전부대사자 하위발사자 대형’ 등 고구려의 관직명과 ‘신라토내당주 신라토내 모인삼백 신라매금’ 등 마치 상대편에서 신라를 지칭하는 문구들로 판독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라비로의 선입견을 가진 학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경 뒤늦게 도착한 건국대 김광수 교수는 석문판독이 진행되는 방안으로 들어오기 전 문턱에 서서 벽에 걸린 탁본을 보면서 그게 왜 진흥대왕이야 고려대왕이지 하는 한마디의 말로 오전·오후 내내 긴장하며 풀리지 않아 고민하던 조사단의 고민을 일격에 풀었다. 조사단들은 일제히 “아! 아!” 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고려비, 즉 한 시골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돌덩어리 하나가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로 탄생되는 역사적이고도 감격적인 순간 이였다. 김 교수는 미리 도착한 조사단의 버스를 못타는 바람에 진흥대왕 또는 신라비라는 선입견이 없는 채 판독을 했기 때문에 첫 글자를 ‘고려대왕’으로 일순간에 판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오후 4시반 경, 조사단장 정영호 관장은 “이 비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기념하기 위해 고구려의 국원성이였던 충주에 세운 것”이라는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후 4월 22일, 단국대박물관에서는 학계의 원로교수들과 전문학자들을 고구려비 현장으로 초빙해 각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비는 한국유일의 고구려비로 장수왕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의됐다.
이때 현장에 참석한 원로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이선근·최영희·황수영·이기백·변태섭·김철준·진홍섭·김동현·임창순·신석호·박노춘·권오돈·김정기·안휘준·김석하·차문섭·서길수 등 한국 최고의 학자들에 의해 고증된 이 비가 ‘고구려비’라는데 한 사람의 이견도 없었다. 이같은 과정과 학자들의 치밀하고도 확실한 실사에 의해 국보 205호 ‘충주고구려비’가 탄생한 것이다. <매주 월요일자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