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은 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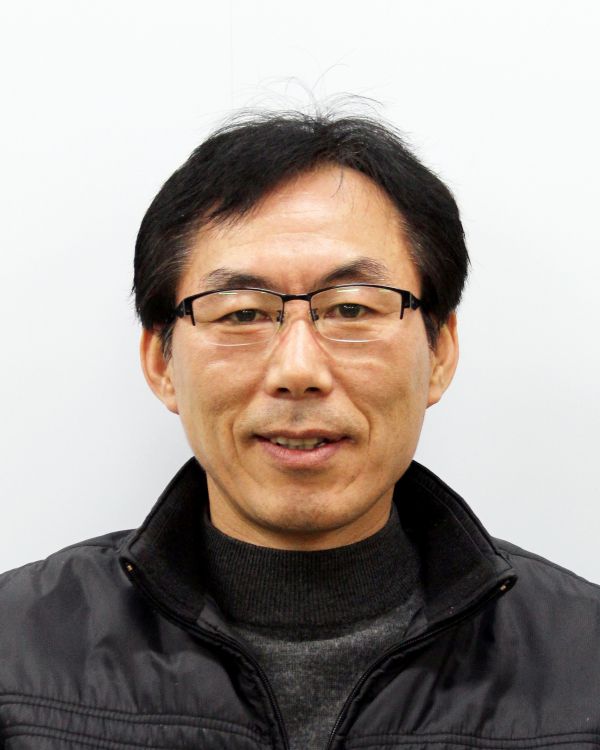
‘넘어짐’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넘어지다’라는 동사를 명사화한 것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로는 ‘전도(顚倒)’라고 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쓰러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재해의 발생형태를 분류할 때에는 물건이 쓰러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라는 한자어로 표기해 오다가 쉬운 우리말 표기에 따라 ‘넘어짐’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재해발생형태는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기인이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되었느냐에 따라 대략 21개로 구분하는데, 떨어짐(추락), 넘어짐(전도), 부딪힘(충돌),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무너짐(붕괴) 등은 자연현상인 중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재해발생형태들이다. 이들 재해발생형태는 산업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재래형재해’라고도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9만1824명으로 2012년(9만2256명)보다 432명 감소하였다. 재해유형은 넘어짐(19.2%), 끼임(16.0%), 떨어짐(15.0%) 순으로 주로 ‘재래형재해’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중 넘어짐 재해는 2302명으로 2012년(897명)보다 약 1.5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산업재해 근로자수는 줄어든 반면 오히려 넘어짐 재해는 점유율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전체 재해발생형태에서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넘어짐 재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현상인 중력의 논리로 말하자면 지면에 닿지 않은 모든 물체는 쓰러지거나 떨어져야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람이 서 있는 것조차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땅히 넘어져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넘어짐’ 유발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인력의 고령화, 작업공간의 협소와 작업자 주변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각종 물건들, 겨울철 눈길·빙판길, 취약계층근로자(여성, 외국인, 고령근로자, 장애인 등) 등을 비롯하여 경비, 환경미화, 음식배달 및 택배 등 야외 작업 활동과 차량운행이 빈번한 서비스업 종사자 및 퇴직 후 재취업근로자의 증가 등은 대표적인 ‘넘어짐 재해’ 유발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넘어짐 재해’ 유발요인의 배후에는 우리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사회적 병리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짧은 기간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는 동안 지나치게 경제논리를 앞세운 나머지 효율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낭비하면 ‘농땡이를 친다’ 거나 ‘게으르다’는 식으로 비난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여 ‘서두름’이 오히려 미덕으로 비칠 정도이다. 서두름은 작업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하게 하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부주의라고 하는데 부주의는 행위의 결과로서 가장 먼저 ‘넘어짐 재해’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부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리석은 사람이 저지르는 미숙함’이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아야 할까?
부주의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부주의’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을 것이며, 작업자의 행위결함을 부주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찾아 근로자를 배려할 때 ‘넘어짐 재해’는 물론이고 부주의로 인해 다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