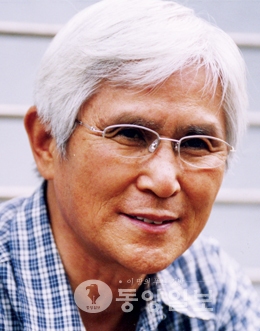
올해 따지기의 주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한 번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 ‘따지기’는 올해가 두 번째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내외는 새해초하루를 쓸쓸히 보냈다. 1월1일을 나라에서 쉬는 날로 정해 놓았건만 손자 둘이 있는 자식식구가 오지 않는 거였다. 그래서 연말을 즈음해서 자식에게 전화로 불호령을 내렸다.
“폐일언하고 이번 새해초하루엔 올 거냐? 안 올 거냐?”
“해마다 설 명절에만 갔잖…아…요?”
“아무리 설 명절은 아니라 해도 일월일일은 새해 초하루 아니냐? 부모한테 새해 인사는 와야지 여러 말 말고 이번엔 애들 데리고 내려와!”
그랬더니 작년 1월1일엔 왔다.
“할아버지, 이번 이천십 오년 일월일일엔 우리 꼭 오라고 왜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작년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번 일월일일에 스키장 가기로 예약까지 해놓고 포기하고 온 거예요. 도대체 뭐 땜에 그러신 거예요?”
꽤 불만스런 어조다.
“얘, 할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버릇없이!”
“아빠,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왜 꼼짝 못하고 무조건 오케이예요. 알아볼 건 알아보고 따질 건 따져봐야지요.”
“얘가 그래두, 가만 못 있어!”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 왜 이 하래비가 잘못했냐?”
“할아버지두 참, 제가 숨쉬기가 가쁘네요.”
“무슨 소리냐 그게. 이 하래비가 알아 듣두룩 말해!”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한 달 후면 설인데 그땐 오잖아요. 그 새를 못 기다리세요?”
“뭣여? 답답해? 따져본다구? 니 말식으루 하면, 넌 손잡이 없는 맷돌이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야 말루 이 큰손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녀석이란 말이다.
“ 예? 그럼 ‘어처구니’가 맷돌 돌리는 손잡이예요?”
“그것두 몰랐냐? 고등학교 일학년이나 돼가지구? 맷돌을 돌리려는데 맷돌 돌리는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느냐. 헌데 이 하래비가 행여 생각지두 못한 황당한 말을 사랑하는 손자한테 들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다 이 녀석아!”
“아버님, 고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저 애가 사춘기라 그런지 제 엄마아빠한테도 막 따지고 덤벼들어요.”
“에미야, 알았다. 이상하고 의문이 있으면 따지는 건 나무랄 게 못돼. 웨래 거기서 몰랐던 걸 배우게 되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그렇네요 배운 게 있어요. ‘어처구니’와 ‘어처구니없다’란 말의 뜻과 어원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래미가 할아버지께 큰 것 하나 배웠네. 결국 따지기는 대화이고 토론이구만. 어떤 말이나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리곤 마침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잖아. 아버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토론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대화? 그건 그럴 법도 하구나. 여하튼 서로 따지다 보면 새로운 걸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건 맞다. 지금 보지 않았느냐?”
이래서 작년 신년 초하루에 식구들이 합의한 것은, 다음 해 초하루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온다는 것과 다음 해인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 원숭이해이니 원숭이와 관련 있는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신년 초와 관계있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을 따지기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제 형과 6년여나 터울이 나는 둘째손자가 뭔가도 잘 모르면서 동의하는 박수는 제일 크게 쳐서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마침내 2016년 병신년 초하루, 지난 해 합의한 대로 3대식구가 모두 모였다. 그리고 첫 번째 따지기주제인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우리 큰손자, ‘조삼모사’란 고사는 알고 있제?”
“예,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오늘을 대비해서 고사 성어 책에서 다시 한 번 찾아 읽었습니다.”
“오 그러냐. 어디 한번 내용을 간단히 말해 보거라!”
“예, 옛날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무척 좋아해서 한 무리의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주인이 정성으로 기르고 원숭이들이 잘 따르는지 서로가 얼굴의 표정만 보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여러 마리들이 먹어대니 먹이가 딸리게 돼서 할 수없이 먹이를 줄여야겠는데 그렇게 하면 원숭이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더래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루는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먹는 도토리를 아침에는 세 개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원숭이들이 막 날뛰면서 성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침에는 네 개 저녁에는 세 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을 바꾸었더니 모두들 좋아라고 펄쩍펄쩍 뛰더래요. 이래서 아침 ‘조’, 석 ‘삼’, 저녁 ‘모’, 넉 ‘사’ 해서 ‘조삼모사’ 라는 말이 나왔대요.”
“누구 큰손잔지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이상하게 여겨진다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느냐?
모두들 머리를 갸웃갸웃 하는데 둘째손자가 손을 번쩍 든다.
“이상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한테 말을 하구 원숭이는 또 어떻게 사람 말을 알어 들어요?”
“우리 둘째손자가 그게 이상하구나. 애비야, 그건 애비가 일러 줘라!”
“예, 그건 말이다. 이게 우화(寓話)라 그래. 우화라는 건, 잘 되라고 가르쳐서 모르는 걸 알 게 하거나 무엇을 빙 둘러서 재미있게 말한 내용을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이 한 것처럼 만든 이야기잖아. 너 이솝우화 책 읽어 봤지. 거기 보믄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잖어. 지금 형이 말한 이 이야기도 중국의 우화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빠,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할 말 없냐. 그럼 내가 한 번 따져보마. 지금 큰손자가 이야기한 고사를 보면,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엔 네 개를 준다고 했을 때 즉 ‘조삼모사’일 때는 원숭이들이 성을 냈고,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엔 세 개를 준다고 했을 때 즉 ‘조사모삼’일 때는 좋아라들 했다. 맞지?”
“예,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후론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조사모삼’을 했을 것 아니겠냐. 세상에 싫어하는 걸 실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다 좋아하는 걸 실행하지. 그렇게들 생각 들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왜 이 고사는 실패한 걸 제목으로 삼았을까. ‘조삼모사’라고. 이왕이면 성공한 걸 앞세울 텐데 말이다. 이점이 좀 이상하다 나는.”
“글쎄요,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도 그렇네요.
이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큰손자가 머리를 한 번 갸웃거리더니 나선다.
“할아버지, 이 고사가 나타내려고 하는 뜻이,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 놀린다.’ 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세 개 주고 네 개 준다는 걸, 나중엔 네 개 주고 세 개 준다고 속였으니까 속인 나중 것보다 원래 속이지 않은 처음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 아닐까요?”
“네 말도 무슨 뜻인 줄은 알겠다만, 그렇다면 고사의 뜻을 더 잘 나타내는 건 웨래 나중 것인 ‘조사모삼’이 아닐까. 아니면 차라리 아주 ‘조삼모사’, ‘조사모삼’ 둘 다 쓰든가. 나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러자 여태까지 참견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 할머니가 짜증스럽게 한 마디 쑥 내뱉는다.
“아유 그건 그렇게 정한 사람 맘대루지 뭘 그 재밋대가리도 없는 이야길 가지구 가타부타 질질 끄노 따질 게 또 한 가지가 남았음서!”
“호호호호, 어먼님이 지루하신가 봐요. 인제 다음 것으루 넘어가야겠네요!”
“그래그래, 다음 따져 볼 것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지이. 그건 우리 큰손자가 먼저 말해 보거라!”
“예, ‘작심삼일’이라는 게, ‘품은 마음이 삼일을 못 간다.’ 그러니까 ‘결심이 굳지 못하다’ 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못 간다’, ‘못하다’ 하는 건 부정하는 말인데 이 말엔 부정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고대로 풀이하면 ‘작심삼일’, ‘품은 마음이 삼일이다’ 아니면 ‘품은 마음이 삼일 간다.’ 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부정하는 글자인 ‘아니 불(不)’ 자라도 하나 넣어서 ‘작심불삼일(作心不三日)’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옳지, 옳지, 우리 큰손자가 이 하래비도 미처 생각지 못한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작심불급어삼일(作心不及於三日)’ 해서 ‘품은 마음이 삼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든지 말이지.”
이번엔 아들이 머리를 갸웃거리더니,
“글쎄 그럴까요. 그건 이미 일반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는 말, 즉 관용어로 굳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니 왈가왈부 할 것 없이 이참에 우리끼리라도 품은 마음이 일 년 내내 가도록 아주 ‘작심365일’로 하지요?”
“그러게 듣고 보니 애비 말도 일리가 있는 같다 허허허.”
그러자 또 할머니가 나선다.
“애그, 황희정승이 ‘네 말도 옳구 네 말도 옳다’ 했다더니, 여기 황희정승 또 한 분 나왔구랴. 이제 그만들 그치고 에미야, 고구마 찐 것 가져와라 그만 입들 틀어막아야겠다!”
이래서 허허허, 하하하, 깔깔깔 들 웃으며 따져보기를 끝냈다. 그리곤 자식 식구들은 재밌다 면서 유익했다면서 해마다 신년 초하루엔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오겠다고 다짐의 약속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