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시인·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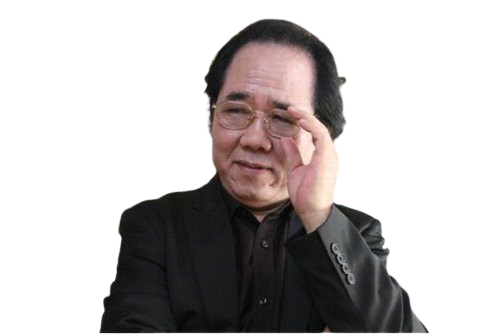
[동양일보]‘밥’은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을 씻어 솥 같은 곳에 안친 후, 물을 붓고 낟알이 풀어지지 않을 만큼 끓여서 익힌 음식을 말한다,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익히더라도 너무 많은 물을 넣어서 끈기가 없으면 ‘죽’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넣으면 ‘떡’이라고 한다. ‘밥을 먹었냐'고 물었을 때 밥 대신 끼니가 될 만한 라면이나 빵, 혹은 시리얼 같은 것을 먹었을 때는 ‘밥 먹었다’는 대답보다 ‘라면을 먹었다'고 대답을 한다. 밥은 한국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끼니라고 할 수 있다.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나라는 아시아권이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서양권은 고기를 곁들여 먹어도 반찬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버무려서 주식으로 본다. 중동권에서도 빵과 생선, 고기, 밥 등을 다양하게 먹지만 우리처럼 밥과 반찬을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는다.
반찬은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양보다 질을 우선해서 만든다. 잘 사는 집은 유기농이나 신선하고 몸에 좋은 재료들로 반찬을 만들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김치에 된장국만 있어도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60년대에는 밥상에 오르는 반찬들은 특별한 날들, 명절이나 손님이 오시거나, 생일 등을 제외하고는 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다. 봄에는 들판이나 산에서 뜯어 온 냉이며 달래며 쑥이나 취나물이며 고사리, 가죽나무순 같은 것이 반찬으로 온다.
여름에는 호박잎이며 오이에 가지나 상추, 열무김치, 부추무침 등이, 가을에는 얼갈이배추나, 알타리무김치, 쪽파, 아욱 같은 것이 밥상에 오른다. 겨울에는 초지일관 김장때 담근 배추김치에, 무김치, 동치미에 된장국이나 콩나물국이 밥상을 굳건히 지킨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오이 냉국이 자주 생각이 난다. 오이냉국이 메인메뉴로 밥상에 오르는 점심때는 어머니께서 찬물을 길어오라고 하신다. 산골 동네는 주로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면소재지 동네는 잘 사는 집 마당에 우물이 있다. 양동이를 들고 땡볕이 직선으로 머리 위에 내려앉는 길을 걸어서 우물이 있는 집에 간다.
일본식 정원이 있는 집 대문 안은 항상 정적이 흐른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들어가면 지붕이 있는 우물이 있다. 지붕 밑에 도르래가 달려있는 우물은 너무 깊어서 밑을 내려다보면 컴컴해서 물이 보이지 않는다. 두레박이 수면을 내려치는 소리가 울리고, 도르래 줄이 팽팽해 질 때쯤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일단 양동이부터 차가운 물을 가득 채우고 남은 물로 목을 축인다.
오이냉국을 만드는데 요즘처럼 홍고추를 썰어 넣고 설탕물을 넣는 것은 아니다. 찬물에 오이를 채 썰어 넣고, 소금으로 대충 간을 맞추고 식초를 살짝 뿌리는 것으로 완성된다. 오이냉국에 보리밥을 말아서 한 수저 듬뿍 떠서 입에 넣고 된장을 젓가락 끝으로 찍어 먹으면 꿀맛이 따로 없다.
시장이 반찬이고, 사람의 입은 간사하다는 말이 있다. 날씨가 더운 날 문득 어렸을 때 먹던 오이냉국이 생각났다. 그런데 요즘 오이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오이라서 오이향이 나지 않는다. 오이향이 안 나니까 국물도 식초냄새만 강하게 날 뿐 별다른 맛이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전체 음식물의 7분의 1가량이고, 버려지는 음식물로 25조원 가량이 낭비가 된다고 한다.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해도 예전의 오이냉국 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먹는 음식보다 버려지는 음식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용히 반문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