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 기본은 소통,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
"사람이 살아있어 좋은 건 다시 배울 수 있기 때문"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 '아내만을 위한 커피'로 일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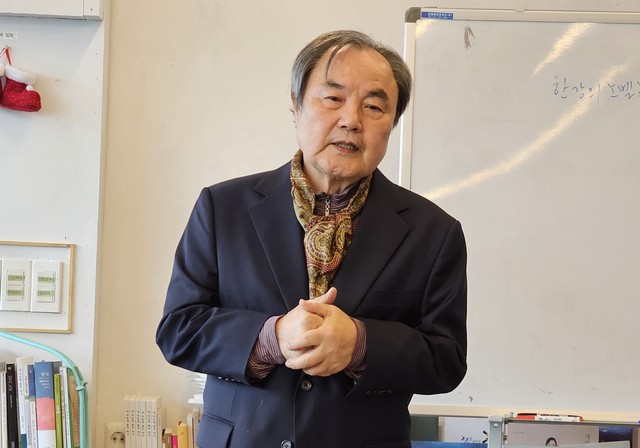
[동양일보 박현진 기자]찬바람이 매섭던 지난 12월 중순, 무심천 변의 한 작은 카페에서 열린 ‘한강 작가와 함께하기’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권희돈(77) 청주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두려움을 글로써 산화시킨 한강 작가는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참혹한 상황을 보고 들으며 죽은 자가 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과거가 현재를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함으로써, 이분법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인을 아름답고 수려한 한글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 중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문학의 기능이 교훈적, 쾌락적 기능 외에 최고의 기능으로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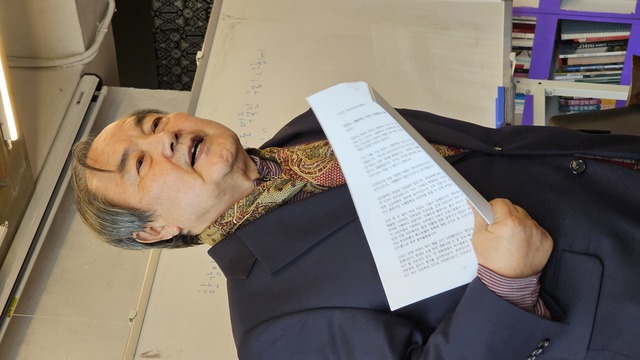
인터뷰에 들어서자, 옛이야기부터 털어놓는 권 교수.
그는 1946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온양고를 거쳐 서울교육대를 졸업하고 초교 교사로 처음 교단에 섰다. 야간대를 다니며 중등교사 자격증을 땄고 명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1988~2011년 23년간, 청주대 국어국문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썼다.
“당시에는, 어차피 교단에 설 거라면 대학강단에 서는 것이 낫겠다 싶어 오로지 공부만 했다”고 회상하는 권 교수.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아내 덕분에 2남1녀를 얻고 나름 성취감을 느끼고 있던 1999년, 서울대 재학 중이던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흔적을 찾아 나섰다. 경찰서, 공항 출입국 등은 물론 전국의 명산대찰을 모두 헤매고 다녔다.
‘실종’은 됐지만 ‘사망’은 믿을 수 없기에 여전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25년의 세월.
권 교수는 2011년 정년퇴직 후 1~2년 무작정 여행을 다니면서야 깨달았다. 이제껏 아들이 사라진 이유를 외부(남)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작 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이의 일기장을 통해 아들은 그때가 사춘기였고 사회와 가족,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들이 힘들었던 시간, 일에만 몰두하느라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내 불찰임을, 그저 초등교사로 살아도 될 것을 굳이 대학교수가 되겠다고, 정작 내가 잘 키웠어야 할 파랑새는 놓치고 만 셈”이라는 것을.
이 통찰이 그를 문학테라피스트로 들어서게 한 계기가 됐다.
이제라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누군가는 나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문학테라피스트로서 그가 하는 일은 결코 요란하진 않지만, ‘쉼’이 없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어둑해질 때까지 아픈 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하루를 끝내고, 며칠 뒤엔 속이 후련해진 아픈 이가 남들 앞에 나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또다른 이를 위로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도 치유를 받는다.

작은 공간을 이동하며 문학을 통한 치유와 소통 강의를 다니는 일은 주요 일과다.
7~8명이 함께 무심천 위를 걸으며 명상하는 걷기 인문학 ‘길 위의 아카데미’를 주관하거나, 10여명이 모여 앉아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말하는 자서전’을 이끌기도 한다.
퇴직 후 창작에도 여념이 없어, 숱한 경험담을 통한 교본집이자 치유에세이 <사람을 배우다>를 펴내고, ‘무심’의 깨달음을 담은 시집 <무심천의 노래>도 발간했다.
향후 경험 당사자들의 양해를 얻어 치유 사례집도 펴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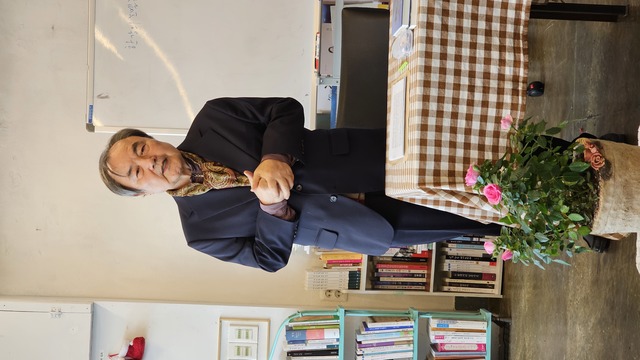
‘(길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하늘이 준 사명’ 같다는 그는 넉넉지 않았던 시절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산 두세 권의 책을 아내에게 들킬라 몰래 품에 안고 들어갔던 때의 미안함을 떠올리며,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아내만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부부간에도 절대적인 소통과 배려가 필요함을 알기에.
“사람이 살아있어 좋은 건 다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신념은 오늘도 문학테라피스트로서 다른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잰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현진 문화전문기자 artcb@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