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선 충북대 의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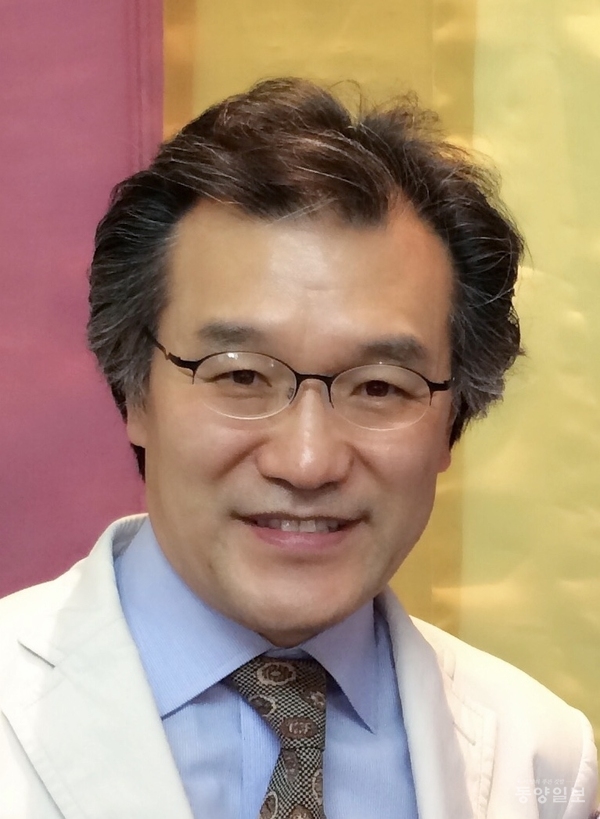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15세기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지형을 뒤흔든 혁명적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 중화질서에 깊이 편입되어 있었고, 많은 대신들은 사대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종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창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실로 놀라운 결단이었다.
세종이 한글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세계관이었다. “ᆞ”는 하늘을, “ᅳ”는 땅을, “ᅵ”는 사람을 상징하며, 이는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이 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생성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은 가획의 원리를 통해 음성학적 자질을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 소리의 세기나 조음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훈민정음의 특징은 비선형성이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표기하고, 이를 결합하여 음절을 만든다. 음소문자와 음절문자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구조이다.
이러한 자질문자적 특성으로 인해 훈민정음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고, 음성학적 원리를 시각화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의 한글 창제에 깔린 인본주의적 노력은 당시 지배층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명사대 세력은 새로운 문자 체계의 도입이 명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상소를 올려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당시 지배층이 가진 특권을 지키려는 의도 또한 깔려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세종이 겪은 어려움은 실로 컸다. 대신들의 반대는 격렬했고, 때로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정도였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라고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내보여 가면서 반대파를 제압했다.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세종의 이러한 의지는 당시 조선의 정치적 현실에서 볼 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신들의 반발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세종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가 조선의 문화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어, 1446년 훈민정음이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의 도입을 넘어,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훈민정음의 반포는 세종의 인본주의적 철학과 자주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으니까.
세종의 이러한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진정한 지도자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세종은 당대의 편견과 반대를 극복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조선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만인이 인정하는 바가 되었고, 보시다시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어는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고, 몇 가지 변화를 거쳤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28개의 자모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24개의 자모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훈민정음의 기본 모음 ‘ㆍ,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이는 현대 한글의 모음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 한글에서 사라진 글자는ㆍ (아래아),ㆆ (여린히읗), ㅿ (반치음)이고, ㆁ (옛이응)은 'ㅇ’의 변형으로, 초성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종성에서는 ‘ng’ 소리로 남아 있다.
을사년 새해,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579돌을 맞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