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팔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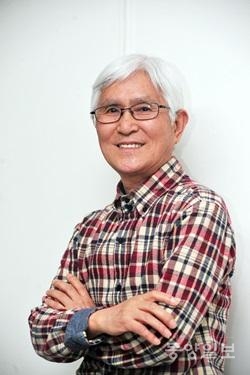
명석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곧 대학교 4년생이 되니 졸업논문을 준비해야 한다. 고등학생 2학년 때 명석인 ‘까치설날’ 에 대해 할아버지께 물었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 설날 노래의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한 분이 윤극영 선생인데, 이분은 원래 이북출신 서울 분으로 이 노래를 1927년 지었다는 구나. 그때 가까운 경기도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실제로 아랫녘(남서쪽) 섬 지방에서는 즉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가장 적을 때인 음력 22일을 ‘아치조금’ 이라 하는데 , 경기도의 지방에서는 이 날을 ,까치조금‘ 이라 한다는 게야”
했던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아치’가 ‘까치’ 가 되었다는 걸 알았었는데,
“그런데 왜 음력 섣날 그믐날을 ‘작은 설날’ 이라했지요. 같은 명절인데도 ‘작은 추석’이란 말은 없잖아요?”
“네 말도 맞다. 한 단계 작은 설날이란 뜻이겠지 음력으로 섣달인 그믐날에 ‘묵은세배’라고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고맙다고 집집을 돌며 어른들께 설날처럼 까치설빔을 입고 절을 올렸지”
“까치설빔을 입구요?”
했었다.
“그래, 까치설날에 입는 까치저고리와 까치두루마기를 차려 입는 설빔이다. 이 옷들은 색동옷이라 해서 다섯 가지 색깔로 된 것으로 저고리와 두루마기 소매에 이어대는 동강이의 조각을 층이 지게 만든 옷이야.”
“이 색동저고리와 색동두루마기는 까치설빔이라 했는데 설날에 입는 옷의 대명사가 됐지요 그게 이상하네요?”
“글쎄다. 그건 이래서가 아닐까. 원은 설빔으로 장만한 것이지만 까치설에도 비록 묵은세배일지언정 세배를 해야 하니 헌 옷을 입고 할 수는 없고 설빔으로 해놓은 새 옷을 입고하면 설에 하는 세배의 예행세배도 된다는 공통적인 생각에서 말이야. 그리구 있는 집에선 까치설과 설빔을 따로 입히기는 했지.”
“그렇군요,”
명석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얘, 오늘 설날 노래가 방송마다 한창인데 1절을 들으면 까치설과 설날 그리고 몸치장 즉 머리에 댕기를 들인다는 것과 설빔 즉 새로 사온 신발에 대해 부른 것이다. 너 ‘댕기’ 아냐 댕기?”
하고 물으시었다.
“말씀해 주세요!”
했었다.
“지금 여자애들은 그런 것 안 해서 잘 모를라. 여자애들이 길게 땋은 머리끝에 들이는 가지각색의 끈이나 헝겊인데,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명절날 머리에 댕기 들인 여자애들 참 멋들어졌지 나 어릴 적 빨간 댕기들인 네 작은 고모할머니 생각난다. 그리구 검정고무신 아냐. 지금은 그런 것 안 신어서 잘 모를라. 설빔으로 옷과 신발이 대표적인데, 그때는 고무신이지 고무신, 흰 고무신과 검정고무신이 있었는데 대개가 검정고무신이면 얼싸 좋다지 뭐.”
그때 할아버진 ‘까치설날’과 까치설날엔 ‘묵은세배’를 한다는 것, 묵은세배를 할 땐 까치저고리와 까치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 까치저고리와 까치두루마기는 색동옷이라는 것, 묵은세배를 할 때 설날에 입는 색동옷을 입는 것은 설의 예행세배도 된다는 것, 그리고 댕기의 멋짐과 설날에 검정고무신은 설빔으론 제일이라는 것 등을 말씀하셨다.
오늘 설날을 사흘 앞두고 할아버지께 설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으려 한다. 점점 양력설날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양력설날에 대해 모호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설(설날)’ 하면 음력이로 1월1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사람들은 30%는 양력설을, 70% 는 음력설((음력으로 1월1일)을 쇠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이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음력설을 선호한다. 그런데 ‘추석’은 다 음력을 말하고 있다. 음력은 달(月)을 말한다. 달이 둥글지 않으면 추석이 아니다, 양력은 일(日)을 말한다. 해는 날마다 둥글다. 날마다 둥그니 모호하다. 그래서 추석은 음력으로 쇠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양력설날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거예요,
“양력설은 따지고 보면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부터다. 새롭다는 것, 진취적이라는 뜻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하면 일본의 속국이 될 거란 생각에서지. 그래도 전통문화의 음력설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고수했지. 그러다 해방이 되어 나라에서는 국제 조류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 이유로 양력설 쇠기를 장려하였고 3일간 법정휴일로 인정도 했으나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우리 전통문화인 음력설을 쇠던 차, 1989년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칙’을 바꾸어 ‘민속의 날’ 을 음력 ‘설날’ 로 바꾸고, 설날 전후 1일과 당일을 합한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러 하니 ‘설날’ 하면 음력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게요.”
“오늘은 너 설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본다고?”
“이제 저도 대학교 졸업생이 곧 되니 이 설날에 대해 논문을 쓰려고요. 그러니 할아버지 어렸을 적 알고 있는 설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마, 나 젊었을 때만 해도 설날에 많은 행사를 했지. 설날 아침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밖에서 부르는 ‘설날 노래’ 가 들려왔지.”
“무슨 노래인데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이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하는 설날의 노래 1절이지.
“그래요?”
“설날엔 모두(어른이나 어린아이나)일찍 일어나 설빔으로 갈아입는데, 이 설빔은 그달 15일에나 있는 보름까지 입는단다.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리고는 설빔을 하고는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낸다. 속으로는 올 한해도 대소사가 평안토록 해달라고 주문도하지. 너 ‘떡국’ 알지. 떡국은 지금까지도 설날엔 떡국을 하니까 알꺼다.”
“그래서 사람들의 나이를 물을 때, ‘자네, 떡국 몇 그릇 먹었나?’ 하고, 아이들에게는, ‘너 떡국 몇 그릇 먹었지?’ 하고 묻기도 하는군요.”
“그래 맞다 맞어. 그리고는 ‘세배’를 한단다. 먼저 집안의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하면 그들은 찾아온 어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주고는 세뱃돈을 주지.”
“저도 집의 어른들께, 할아버지를 비롯한 할머니, 아버지, 엄마께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께도 받았어요.”
“그랬어. 잘했다. 그리곤 복조리 있지 복조리. 설날 새벽이 되면 또 섣달 그믐밤 즉 설날 전날 밤이 되면, ‘복조리 사시오! 복조리,’ 하고 동네 골목을 더투면, 이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 두면 복을 받는다는 풍습이 있어 할머니 같은 아낙들은 이걸 사서 벽에 걸어두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지금도 ‘복조리 사요! 복조리요.’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사서 벽에 걸어 두던데요.”
“너 ‘조리’ 가 무엇인지 아느냐?”
“조리요? 조리는 쌀을 깨끗이 이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조상들은 이 복조리로 복을 일어 갖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래서 사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너 또 ‘야광귀’ 라는 것 알아?”
“글쎄요 들은 것도 같고….”
“설날 밤에 야광귀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게야. 그 신발이 자기 발에 꼭 맞으면 그 신발을 신고 가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야광귀가 신고 사라진 신발의 주인은 그해의 운이 나쁘다고 믿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신발을 방안에 들여놓고 일찍 불을 끄고 잤다는 게야. 이 야광귀신을 막으려고 말이지. 그 대신 체의 올이 고운 걸, 너 ‘올’ 이 무언지 알아?”
“가루를 곱게 쳐내는 거잖아요.? ”
“맞다 맞어. 그 올이 고운체를 대문 위에다 걸어놓고 말이야.”
“왜요?”
“야광귀신이 신발을 신으려고 왔다가 그 체의 구멍이 많은 것을 보고는 세어보다 신발을 신어보는 것도 잊어버려 새벽닭이 울면 가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지.”
“참 그때 사람들의 머리가 묘하군요. 그러한 생각을 다 하다니 말에요.”
“그런데 말이다. 어느 곳에선 1월1일 새벽에 야광귀신을 쫒는다고 마루에 딱총을 놓은 다음에 대문 위에 체를 걸어놓기도 했지.”
“지금은 그런 일들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믿나요.”
“그래,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한 점도 있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아참, 설날 세뱃돈 애기 끝에 나와야 하는데 깜빡했구나. 옛날엔 ‘문안비’ 라는 게 있었다.”
“문안비요?”
“옛날엔 한다하는 집안에서는 여자가 남자같이 함부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였지. 그래서 설날엔 여자는 세배하러나가지 못했어. 그 대신으로 한다하는 집안에선 부인들이 옷 잘 차려 입힌 종아이를 대신 세배해야 할 집에 보냈는데, 그 종아이를 ‘문안비’ 라고 했다.”
“그래서요?”
명석인 그 다음을 재촉했다.
“문안비를 맞은 집에선 그 문안비에게 세배상을 차려주고 세뱃돈을 주었단다. 귀한 손님처럼. 그리고 그 집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로 문안비를 보냈어.
“이제 알겠어요, 그렇군요.”
“윷놀이는 지금도 하지. 윷놀이는 신라 때부터 있어온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우리나라만 있는 놀이로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이 즐기는 놀이다.”
“정말 그래요? 그게 신라 때부터 있어 왔다구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놀이라구요. 처음 듣는 데요.? 저기 말판두 있어요. 설날 되면 우리 윷놀이 할 거예요. 할아버지두 같이 해요 네?”
“그래 고맙다. 근데 너 ‘널뛰기’ 는 알라.”
“널뛰기요! 예, 알아요.”
명석인 널뛰기에 대해서 안다. 명석이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그해는 눈이 푸실 푸실 내렸느니라.’ 하고는 암말도 안 하셨을 때 하도 그 말이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혹시 그 말의 뜻을 아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쿡쿡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말이야 니 할머니한테 들은 말인데, 그해는 설날에 눈이 푸실 푸실 내렸단다. 그래서 그 눈을 맞으면서 여기서 이십 리나 되는 니 고모할머니 시어른한테 세배를 갔는데 그 동네 어귀에서 널뛰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았더니 울안에서 노랑저고리 입은 처녀가 솟아오르더라는 거야. 그래 그러는 걸 구경하다가 그 처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지. 그래서 요샛말로 필이 통해 결혼하게 된 거란다.”
하던 말이 생각나서 빙그레 웃었다. 그걸 보고 할아버지는 ‘싱거운 녀석’ 하고는 피식 웃더니,
“지금도 가끔 보는 널뛰기는 여자들의 놀이로 어린 아이로부터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 옷을 입고 집집마다 동리마다 널뛰기를 했지. 이건 고려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담 너머로 밖의 구경을 했다는 말도 있어.”
명석은 또 웃었다.
“싱거운 녀석.”
하고는 할아버지도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신다.
“설이 되면서부터 남자들은 윷놀이, 여자들은 널뛰기를 했는데, 여자들이 고운 옷으로 차려 입고 차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널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어.”
명석인 또 한 번 웃었다, 할아버진 이번엔 빙그레 웃으며 옛날 할머니와의 일을 상기하는 듯했다. 명석인 말을 돌렸다.
명석인 사흘 후 설날에 증조할아버지 내외를 비롯한 조상님들의 명패가 걸리고, 가지각색의 음식이 차려진 차례 상에 절을 올리고 나서,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 나에겐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산소에 갔다 와야지요!”
하니. 할아버지는,
“차례 다 끝나고 가야지.”
하셨다.
그러고 보니 아직 차례가 끝이 안 났다. 아버지 엄마가 명석이의 아랫도리를 꼬집는다.
“차례 끝나고서….”
할머니의 말씀이다.
“그래, 가야지.”
할아버지의 말씀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와 명석이가 성묘를 가려고 할 때 명희(명석이의 누이)가 남편과 애(남매)들과 함께 문안이로 들이 닥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니. 너희들이 어쩐 일야!”
동시에 놀란다.
“오늘 설날에 친정에 갔다 오라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에. 동네 아무개가 작년부터 며느리 친정엘 보냈다더니 요새 그게 유행인가 보네.”
할머니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며느리친정 보내야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신다.
“아냐 이따 성묘 갔다 와서 곧 며느리 식구 다 보냅시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윗대조상들의 성묘를 마친 후 아들. 며느리. 명석이 뭉땅 며느리친정엘 보내기로 했다.
“아이고, 아버지 엄마가 우리 본따서 오빠 내외와 명석이꺼정 다 언니 친정엘 보내시는구나!”
“아냐 요새 추세가 그렇지 않냐?”
“그러게요. 여하튼 잘들 결정하셨어요. 그치 언니 여하튼 우리 덕분인지 알아요!”
“고마워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명석이도 초하루 명절에 외갓집으로 가기로 하니 기분이 좋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