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시인·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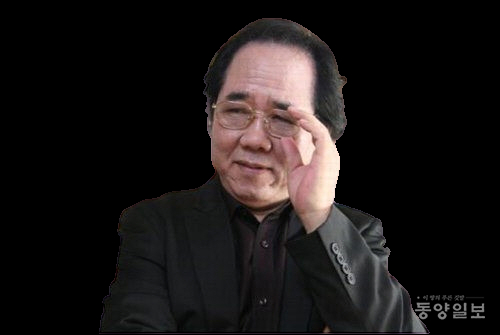
봄은 늘 조용히 다가온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처럼은 아니지만 늦겨울을 사쁜히 즈려 밟으며 소리 없이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목련을 피우고, 언덕에는 개나리꽃을 흐드러지게 뿌려 놓는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절기 중에 ‘곡우’가 있다. 냇가의 버드나무 가지가 제법 탱탱하게 바람을 날리기 시작하면 논두렁 사이로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예부터 곡우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다. 벼농사 준비로 남정네들은 밭을 갈고, 아낙들은 씨앗을 손질하고, 아이들은 들꽃을 쫓아 논두렁을 달렸다. 바지런한 할머니는 곡우물 길으러 새벽부터 우물가로 향했다.
곡우날 아침 일찍 우물에서 물을 떠오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액운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물은 씻거나 마시는 용도 외에도 씨앗을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조상들은 자연의 기운이 응축된 물을 통해 곡식의 발아와 성장을 도왔다.
또한, 곡우 무렵에는 제를 지내는 풍습도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 산신제, 농신제, 용왕제 등을 지내며 풍년을 기원했다. 곡우는 곧 신에게 올리는 첫 번째 농사의 기도였던 셈이다.
지금은 산골 벽촌에 찾아가도 우물을 구경할 수 없다. 우물이 있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고 이발소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산골 풍경에 승용차며, 1톤 포터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예전의 어른들은 곡식은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다. 논밭에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곡식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다. 요즘은 비닐하우스도 스마트폰으로 개폐한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창문 밖의 날씨를 보고, 비닐하우스의 문을 여닫거나, 햇빛 가리개를 걷어 낸다.
자연이 농부의 수고에 화답하듯 뿌려주는 생명의 물. 비가 와야 씨앗이 숨을 쉬고, 흙이 부드러워져 싹이 돋는다. 예전 어르신들은 곡우에 비가 내리면 “올해는 한 해 농사 걱정 없겠다”고 안도의 숨을 쉬셨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 어귀에 용왕제를 드리거나, 물을 끌어오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 ‘귀농·귀촌 장려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농촌의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그 뉴스 화면 속 풍경은 실상보다 훨씬 어둡다. 실제의 농촌은 늙었고, 조용하며, 오래된 시간 속에 잠겨 있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이 고령화되는 것은 미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줄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촌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67세. 일손은 줄었고, 빈집은 늘었으며, 마을회관은 정적에 잠겼다. 고령화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붕괴를 뜻하는 현실이다.
누군가는 농촌을 그저 ‘한적한 시골’로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촌은 우리의 식탁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벼, 보리, 고추, 마늘, 무, 배추,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거의 모든 먹거리가 농촌에서 자란다. 그런데 그 생산 주체인 농민의 대부분이 70대에 진입했거나 그 문턱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식량의 자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욱이 기후 변화와 세계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식량 자급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의 농촌은 ‘대체 인력’ 없이, 고령의 농민들 손에 의존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건, 국가 안보를 느슨히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비는 내린다. 하지만 그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줄었다. 마을에 사람이 없다. 어쩌면 가장 절실히 비를 기다리는 건, 이제는 텅 빈 비닐하우스의 고추 모종이나 주인 없는 논에 어지럽게 핀 민들레뿐일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