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선 충북대 의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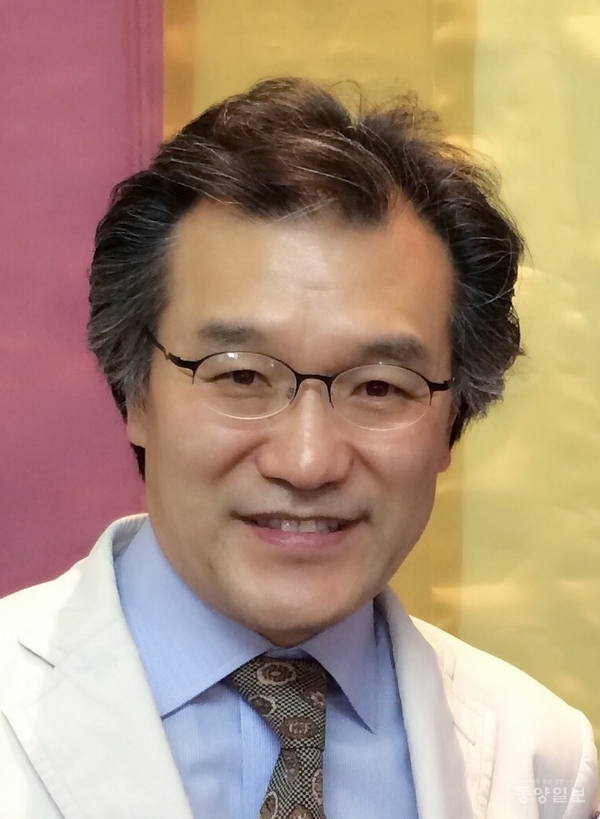
“옷”과 “꽃”이 가장 예쁜 한글 단어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단다. 그 모양만 보아도 “옷”인 줄을 알겠고, 자태만 보아도 “꽃”인 줄 알겠다고 한다. 새로운 시선이 빛난다. 정말 글자 모양이 사람과 꽃을 신기하게 닮아 있다. 요즈음 외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글 배우기가 유행이라던가.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관심이 많다고도 한다. 그들이 글자를 배우며 재미를 나누는 순간, 더욱 더 많은 밈들이 눈앞에 보이리라. 그들은 또 ‘우유’라는 낱말이 그렇게도 재미있다고 한다. 우유가 쏟아지면 글씨가 옆으로 넘어져 아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발하다.
듀오링고는 온라인 최대의 외국어 학습 어플이다. 누적 구독자가 5억이라고 하니 가히 놀라운 규모다. 현재 40여개국어의 언어학습코너가 있고, 한국어도 들어 있다. 모국어 별로 배우고 싶은 언어 목록이 별도로 나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목록에 한국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2020년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은 쾌거, 그리고 더 많은 한류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 진출이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키는데 한몫 했다고도 여긴다.
2011년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과학부의 루이스 폰 안과 그의 제자인 세버린 해커가 만든 듀오링고는 언어 학습을 흥미롭게 만들어 재미와 성취감을 제공한다. 알파벳부터 지루하게 학습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 앱은 흥미롭게도 소수민족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나바호어이다. 이 언어는 소수민족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교육자 층이 있어서 채택 되었다고 한다. 원주민 언어의 부흥에 기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현재 나바호어는 약 15만 명의 화자가 있다.
라틴어는 바티칸시국의 언어인데 교황 등 인구 천 여 명 소국가의 공식 언어이다. 원어민은 없고, 약 300여명 유창한 화자가 있을 뿐인데, 주로 가톨릭교회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UN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고, 투표권은 없다. 일상적으로는 주로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라틴어는 대표적으로 생물체의 학명에 사용된다. 호모 사피엔스는 라틴어 학명의 대표적인 예인데, 과학, 의학, 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표준화된 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함으로써 학문내-학문간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라틴어는 여전히 살아있는 언어인 것이다.
라틴어는 영어의 어근을 이해하고, 학문적,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뉴튼은 영어와 라틴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지만, 1687년의 유명한 프린키피아는 라틴어 저작물이다. 17세기의 학술표준어는 라틴어였기 때문이다.
한편 듀오링고는 아프리카어도 제공하고 있다. 반투어계 일족인 줄루어는 아프리카의 고유 언어인데, 흉내 내기 힘든 클릭사운드를 사용한다. 듀오링고는 언어 다양성 보존과 문화적 인식 제고를 목표로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클릭음은 매우 특이하여 다른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여가수 미리암 마케바의 노래 ‘Qongqothwane (1963)’은 클릭음을 들려준다. 제목은 ‘콩코트와네’ 정도로 읽히지만 실제 발음의 국제음성기호는 복잡 난해한 úkǃóŋǃo̤tʰʷaːné 이다. 이중 두개의 느낌표가 클릭사운드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시계소리 똑딱똑딱을 혀로 흉내 낼 때 나오는 그 똑 소리의 좀 더 힘찬 버전이라고 할까?
Qongqothwane는 “knock-knock beetle” 또는 “똑똑이 딱정벌레”를 의미한다. 남아공 코사족은 이 벌레가 행운과 비를 가져다준다고 믿어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른다. 이 벌레는 짝짓기 의식의 일부로, 신기한 클릭음 “똑똑” 소리를 만든다.
세상 최고로 복잡하여 듀오링고도 못 싣는 또 다른 언어인 !Xóõ는 총 161개의 자음과 모음 음소단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보츠와나와 나미비아에서 약 3천명 반유목민들이 사용 중인데 다만 학자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 이들 음소 모두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음성기호학회는 2020년 기준, 155개의 표준음성기호와 31개의 추가변별기호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어의 것은 약 40개 내외라니 정말 “세상은 넓고 소리는 많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