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화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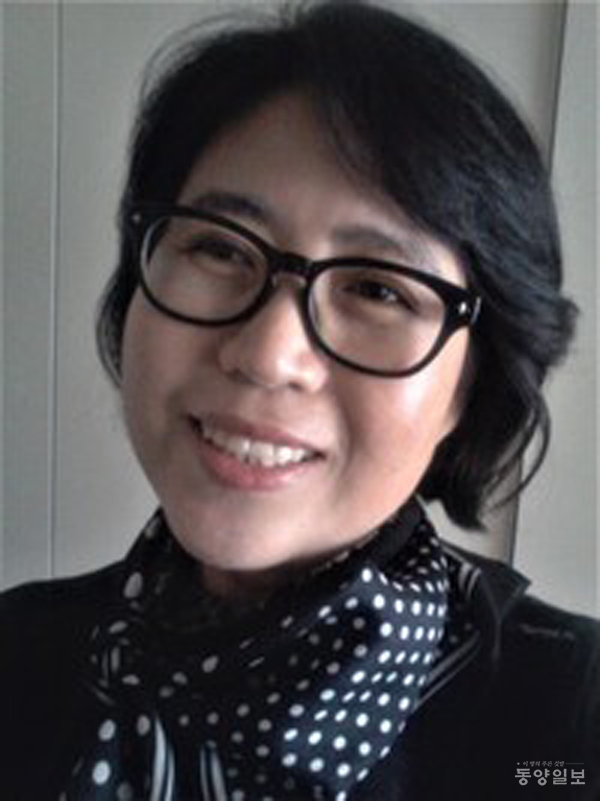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이다.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와 대비되는 신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지상을 다스리게 된다. 제우스의 번개에서 불을 훔친 대가로 몇백 년 동안 코카서스산맥 절벽에 결박되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참혹한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매우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의 어원은 ‘앞(pro)’과 ‘생각하는 자(metheus)’에서 왔다. 예지력을 지닌 선지자를 뜻한다. 흙과 물로 인간을 만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벌거숭이에게 유일한 불을 선물한다. 불은 추위를 막거나 음식을 익히는 도구를 넘어 인류에게 비약적인 도약을 가져다 준다. 바로 문명의 점화였다. 지혜, 기술, 문화의 상징으로써 불은 인류가 우주에서 위대한 문명을 이룰 존재임을 알아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신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불로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 문화를 바꾸었다. 청동을 만들고 철을 제련하여 도시와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전기와 원자력, 디지털 등의 에너지로 확장하여 문명의 중심축으로 자리했다. 반면에 화재, 전쟁,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한다. 우리가 만든 불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는 순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은 쉽게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이며, 고도의 문명에서도 다스리기 힘든 물질이었다.
처음 불을 사용한 것은 약 5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번개와 화산에서 발견한 자연의 불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움을 느껴 피해 다녔다. 그러다가 돌을 부딪쳐 불을 만들게 된다. 몸은 연약했으나 불을 얻음으로써 생존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수렵 채취시대를 열었다. 인간이 자연을 바꾸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때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야만의 시대'라 일컫는다. 비록 단명했지만, 불을 지배함으로써 삶의 질을 끌어올린 결과다.
인류 초기부터 필수 에너지인 불, 오늘날에도 불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 그러나 불이 주는 고통과 편익은 매우 이중적이다. 세계 곳곳이 찬란하나 불로 솟구치고, 흔들리고, 파괴되며 신의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불은 축복이자 경고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야 할까?
일찍부터 인간은 불을 신성시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그 신성함을 유지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릴 때면, 고대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태양광으로 성화를 채화한다. 이 불은 수많은 손을 거쳐 세계를 순례하고, 새 도시의 제단에 오른다. 그것은 단지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불이 여전히 인간의 손이 아닌 어떤 더 큰 질서에서 왔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불 앞에서 느끼는 무언의 약속, 인간 정신의 정화와 인류 존엄을 향한 대서사다. 여전히 우리 무의식은 불을 경외하고, 신성이라는 오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얼마 전 대형 산불로 큰 참극을 겪었다. 화마가 남긴 상처는 무자비하며, 욕망과 절제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는다. 검게 타버린 산과 마을은 우리 문명이 얼마나 위태로운 경계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불을 지른다'(시, 「타는 목마름으로」)라며 자유와 저항의 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즉, 우리가 손에 쥔 불은 자유와 저항의 영웅 프로메테우스가 건넨 빛이자 그림자다. 인간의 문명과 정신, 자유와 파괴, 생명과 죽음까지 아우르는 신의 도구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로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책임과 사유로 불을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