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시인·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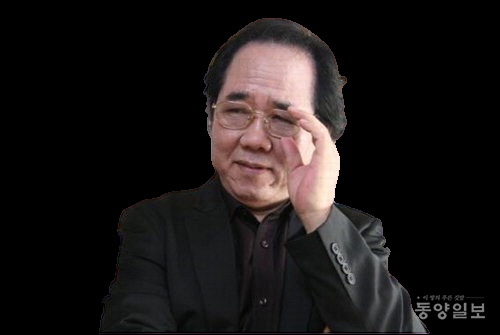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고리를 잡는다. 그중에서도 관공서나 은행처럼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공간에서는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도 인간관계의 풍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뒤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문을 꼭 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 상대적으로 나만 빠르게 지나가려는 듯 문을 재빨리 닫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품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엿 볼 수 있다.
문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배려가 습관화 되어 있다. 이들은 문을 열며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본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혹시 나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이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염려다. 문을 잡아 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사회를 위한 작은 배려의 말없는 제스처다. 타인을 위해 문고리를 잡아주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을 벌려보면 누구나 행복이 있다. 하지만 손등을 보면 행복은 흘러내려 버린다.
반면 뒤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문을 덜컥 닫아버리는 사람은 ‘나만의 안위’를 중시한다. 그들에게는 문을 놓칠까 조바심 내는 마음이 먼저이고, 다른 사람이 뒤따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하는 급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굳이 성급하게 문을 닫아버릴 필요는 없다. 그들은 ‘내가 잘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살아간다. 이는 개인의 효율성을 좇는 문화가 일상이 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 하나를 두고도 양극단의 태도를 마주한다. 배려를 몸에 익힌 사람은 작은 순간에도 타인을 생각한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쾌적함을 우선한다. 누군가는 문을 잡아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특별히 미화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의 사소한 행동이 모여 그 사람의 품성과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을 잡아주는 행위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문고리를 잡아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뒤에 사람이 보이면, 한 박자 늦춰 손을 문고리에 얹어보자. 그 작은 멈춤이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않은 위로가 되고, 나 자신에게는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여유가 된다. 더불어 내가 받은 배려를 기억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타심이 아닐까.
가끔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수고 하십니다.’라는 말을 걸면서 타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이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받아주는 운전기사가 있는가 하면, 묵묵히 문 닫기만 기다리는 경우도 흔하다. 전자의 경우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대화가 이어진다. 대부분 세상 사는 이야기다. 날씨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폼새, 서로의 고향을 묻기도 한다. 어쩌다 동향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그랑께, 거기 강가 가 봤슈? 어렸을 때는 방학 때면 거기서 살았슈. 저절로 사투리가 나온다. 혹시 나이가? 아 육학년 오반유? 이럴 때는 박카스 한 병보다 더 쉽게 운전기사의 지친 몸을 풀어 줄 수가 있다. 혹시 운동해유? 원래 죙일 차안에서 앉아 있는 직업이다 봉께, 운동 안하면 안돼유. 워녕 그려. 저는 아직 환갑도 안 된 줄 알았슈? 허허! 하긴, 제가 좀 동안이라는 말을 듣긴 해유.
말품 파는데 돈들어 갈 이유 없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법 없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세상을 산다는 지혜는 내가 배려를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웃음을 공짜로 받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