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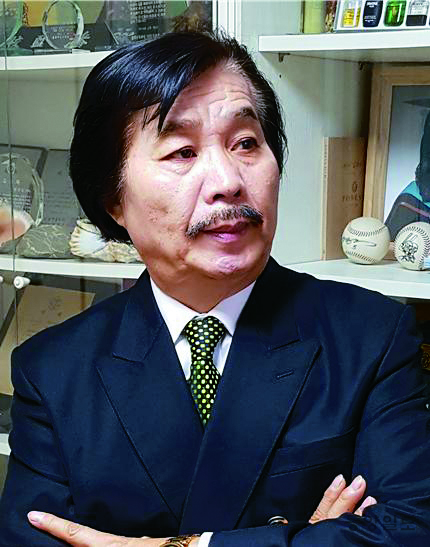
필자는 청주에서 고향인 음성원남으로 1주일에 월, 목요일 두 번씩 밭농사를 지으러 다닌다. 그런데 제일 힘든 일은 잡초와의 싸움이다. 옛 어른들 말이 잡초는 뽑고 돌아서면 벌써 또 자라나고 있다고 했다. 딱 들어맞는 말이다. 풀이 무성한 이 여름철엔 어디든 잡초가 흔하다. 쉽게 자라기도 하지만 뽑아도 뽑아도 또 나오는 게 잡초다. 흙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도로이건 인도이건 지붕이건 벽돌 틈이건 어디에서나 잡초는 잘 산다. 하지만 잡초라는 풀은 없고 저마다 이름을 가진 식물이다. 잡초의 생명력을 알게 된 첫 기억은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 농사를 지을 때였다. 벼가 무성한 논에서 자라는 피를 뽑아 길바닥에 밟아 버렸는데도 다시 살아나 곤 했다. 피는 같은 벼과 식물로 벼가 자라는데 방해된다고 가장 먼저 제거되는 잡초다. 나훈아가 1982년 발표한 노래 잡초, 그 가사 일부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 노랫말은 그 잡초들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감성을 살리기 위해 잡초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하찮음, 쓸모없음, 성가심의 느낌만을 주목했을 뿐이다. 잡초는 농부의 관점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경작지에 자라는 쓸모없는 풀들이다. 고향 시골마을엔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다. 서글프다.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폐허에서 맨 먼저 보이는 건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이다. 풀들이 무성할수록 얼마나 오래 방치된 집인지 알 수 있다. 어쩌면 고향마을 주인은 사람보다 어디든 잘 자라는 잡초가 아닐까? 사실 잡초 중에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많다. 쑥은 떡이나 차, 약으로 먹고, 민들레나 돌나물도 약효 뿐 아니라 반찬으로도 자주 먹는다. 질경이, 명아주, 개망초 등도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국거리, 무침으로 사용되지만 아무 곳이든 자라니 잡초로 분류될 뿐이다. 도심에서 자라는 잡초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숲이나 산에서 다른 종자들을 피해 비교적 강자들이 없는 도시로 나온 도망자들이다. 식물도 주변에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경쟁자들이 있으면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걸 아나보다. 인도의 신호등 기둥아래 벽돌 틈 사이로 자라난 보리를 본 적이 있다. 아마도 환경미화요원 입장에서는 그 보리가 잡초라고 여겼을 것이다. 모든 풀이 잡초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벼도 수천 년 전에 어디에선가 이주민의 행렬에 우연히 따라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때는 벼도 잡초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잡초는 언제 싹을 틔울까? 일본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는 농부들이 발아시기를 알고 씨를 뿌리는 농작물과는 다르게 잡초는 당장 싹을 틔우지 않는 대신 발아에 적합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잡초를 포함한 야생식물은 땅 속에서 숨어 있다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서 나오는데, 전제 조건이 겨울 추위 같은 저온을 경험한 후로 이를 ‘저온요구성’이라고 한단다. 새싹이 나오기 위해 묵묵히 몇 년 혹은 몇 십 년도 기다리는 씨앗도 있단다. 잡초가 종자를 번식하기 위한 노력은 기다림만이 아니다.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 화려한 꽃을 피우거나 씨앗을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새의 분비물 속에 혹은 길가나 차도에 피어나 사람들의 신발이나 자동차 바퀴에 묻어 멀리 씨를 퍼뜨린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게 변하는 생명들만 살아남는다고 했다. 지금 지구상에 모든 생명은 변화에 적응해서 남은 후손들인 셈이다. 후미진 골목 구석에 박혀 있는 저 흔한 잡초도 살기 위해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피할까. 요즈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갖가지 사무도 AI가 처리한다. 거기다가 기후환경까지 급변하니 우리네 인간들도 변하는 길 밖에 없다. 인간들도 어찌하랴! 그러나 혼자만 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 지지체, 사회, 이웃과 우리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