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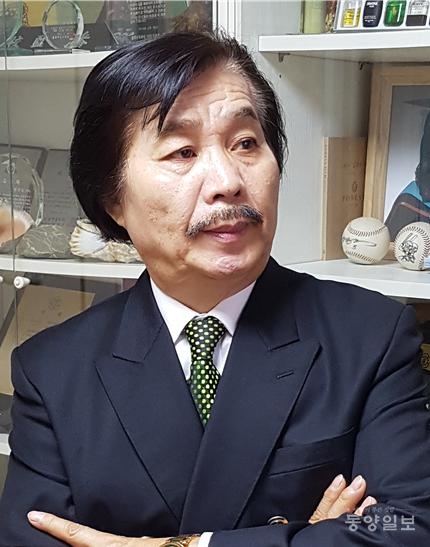
제주도의 돌담은 여간한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돌담들은 돌과 돌의 사이를 메우지 않아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돌담의 종류로는 집짓기 위해 쌓은 축담과 집 울타리를 두르는 울담, 밭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쌓은 밭담이 있다. 바닷가엔 고기를 잡기 위해 쌓은 원담도 있다. 제주도 돌담에는 타 지방과 다른 특징이 있다. 돌과 돌 사이를 메우지 않아 구멍이 숭숭 뚫렸다. 제주도는 바람이 너무 강해 돌담에 구멍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돌담의 구멍은 바람을 찢어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제주도 돌담에 담긴 지혜이다. 바닷가 원담의 구멍은 밀려온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갈 때, 바닷물만 보내고 물고기는 잡는 ‘돌 그물’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하듯 우리 마음에도 세상의 바람을 막아줄 영적인 돌담이 있어야 한다. 사람사이에도 틈이 있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세상 풍조에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받아주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돌담은 제주의 환경적 열악함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열쇠였다. 돌담은 널려진 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정리하면서 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풍속을 줄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흙의 유실을 막는다. 또한 방목하고 있는 우마가 침입하여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았다. 거기다가 명확한 토지영역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돌담은 방어시설, 어로시설로도 활용됐다. 이렇게 돌담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만큼 돌담의 축조방법이나 형태도 가지각색이란다. ‘백켓담’은 담의 아랫부분을 작은 돌멩이로 빈틈없이 여러 겹으로 쌓아올려 그 위에 큰 돌로 틈새가 나도록 한 줄로 쌓은 담이다. 밭의 경계를 두를 때 이용하는 ‘외담’은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외줄로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쌓아올린 담으로 쌓은 후 한쪽 끝에서 흔들면 담 전체가 흔들리도록 쌓아야 제대로 쌓은 담으로 친단다. 이렇게 쌓은 담은 바람에 유연하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도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요즈음 일류만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 직업, 의식주, 신랑감도 일류, 아이도 일류, 모두가 일류를 지향하고 있다. 상위 몇 프로, 국내 제일, 아시아 제일, 세계 제일 등 일류병에 푹 빠져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세상이 일류만을 추구하는 까닭에 2등과 3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수많은 등외는 쪽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다.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 놓는다. 그것을‘페르시아의 흠’이라 부른단다.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는다고 한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 부른단다. ‘경허스님’은 비뚤어진 나무는 비뚤어진 대로,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쓸모가 있듯이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하물며 사람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설 수가 있는 빈틈이 있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 틈새가 아닌 제3의 공간인 틈새가 존재할 때에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빈틈을 내고 나 자신의 빈틈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빈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주도의 돌담처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인 것이다. 때로는 모자람도 미덕이다. 빈틈이 있어야 햇살도 파고든다. 빈틈없는 사람은 박식하고 논리정연해도 정이 가질 않는다.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이미 들어온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틈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창구이다. 굳이 틈을 가리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열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빈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틈은 허점이 아니라 여유이다. 틈이 있어야 인간적이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연인과 부부, 가족과 친척, 남녀노소 이웃과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제주 돌담처럼 서로서로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맛보며 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