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충북교육청 재정복지과 재산사학학운위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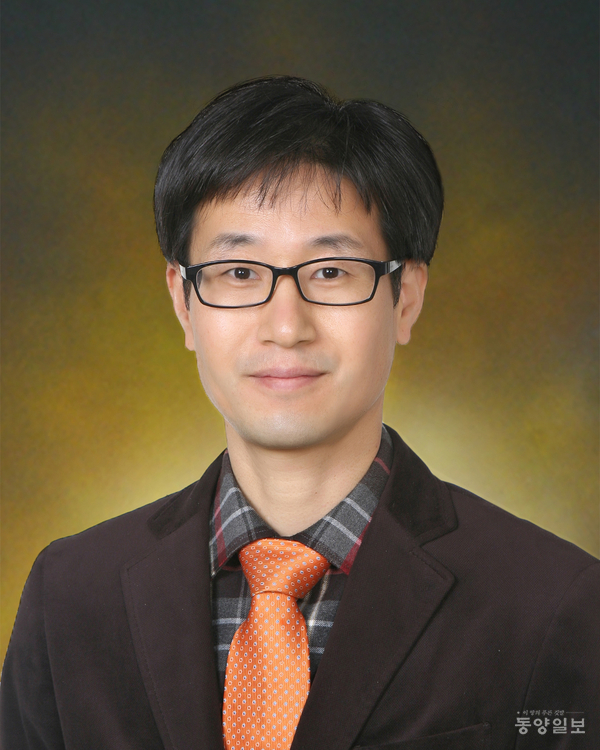
'삼국사기'에는 금척(金尺)에 대해, 신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게 금척을 주며 "이것은 왕의 증표이니 길이 자손에게 전하라, 백성 가운데 아픈 이가 있으면 이 자로 재어 치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왕은 금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하늘로부터 선택된 자임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혼란의 시기인 고려말 다시 등장한다. 이성계는 남원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산의 모습에 놀란다. 꿈에 신으로부터 금척을 받았던 산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그곳에 머물러 기도했고, 이후 조선을 세운 뒤에는 꿈속 금척을 앞세워 혁명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반신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캠퍼스(規)와 직각자(矩)를 높이 들고 있는 인상적인 모습의 복희(伏羲)와 여와(女媧)가 있다. 캠퍼스와 직각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위’와 이를 근거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상징물'로 묘사되는 것 같다.
어느 시대나 사물에 대하여 기준을 세우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고 권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의 시황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한국의 경우 대한제국 시절 광무개혁을 통해 '미터법' 도입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 한국전쟁 등 수많은 변화와 함께 단위에서도 SI 단위계(미터·킬로그램 등), 척관법(尺貫法), 야드 파운드법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현재는 'SI 단위계'를 표준으로 했다. 특히 거래나 제 증명 등에서는 SI 단위계만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물건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면서, 종류만 같다면 물건들을 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고, 같은 단위로 잴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의 단일경제는 가속화됐다.
구구절절하게 '금척'을 말하지 않더라도, 업(業)에 따라 △ha △아르 △에이커 △피트 △인치 △야드 △리 △온스 △파운드 △돈 △냥 △근 △관 등을 말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위치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한번 만들어진 단위와 위치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1994년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자, 대중은 박찬호의 구속에 대해 '마일'이라는 단위로 말하였고, IMF 시기에는 골프선수 박세리가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투혼을 불사르며 우승하자, 언론에서는 '야드'라는 단위로 보도했다.
개인의 삶에도 '옮음과 그름', '참과 거짓' 그리고 타인에 대체되지 않는 자신만의 '금척'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와 사회 역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척'이라는 기준이 절실할 것이다. 사회가 복잡·다양화될수록, 평범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신화 속 '금척'과 ‘금척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를 찾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