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선 충북대 의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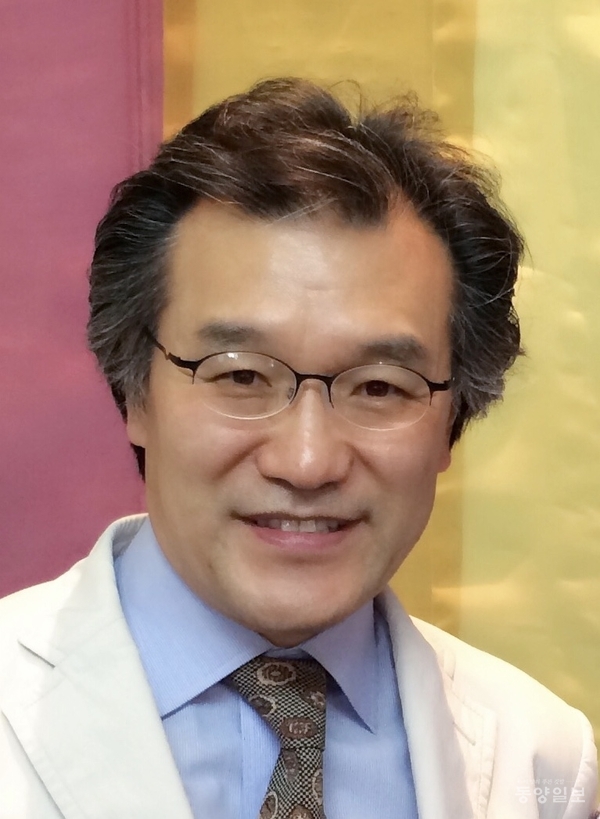
영화 ‘기생충’은 영어 더빙 없이 한국어와 자막만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는 언어의 쓰임새가 단지 이해의 도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세계가 통일된 언어 없이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극적인 사례였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나 보다 편리한 소통을 바래왔던 끝없는 도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불의 사용과 바퀴의 발명, 농경의 시작이 물질문명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듯, 문자의 발명은 지적·문화적 차원을 새롭게 연 문명사적 전환이었다.
문자는 지식과 경험을 기록하는 ‘기억의 도구’이자, 세대를 건너뛰어 축적되는 합의의 위대한 도구이다. 쐐기문자나 상형문자에서 알파벳과 한자에 이르기까지, 문자 체계는 인류 문명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2025년 현재, 인류가 발명했던 문자 체계의 수는 약 293개로 파악되고 있다.
21세기 현재, 글로벌 소통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허물고 AI 시대에까지 이르렀지만, 언어 간 장벽은 여전히 단단하다. 그렇기에 인류는 ‘세계 공통 문자’라는 보편적 이상을 오늘도 계속 꿈꾸고 있다.
에스페란토, 국제음성기호(IPA), 유니코드 등 다양한 문자 체계가 있지만, 현재 실용적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체계는 없다. 기술적 문제도 문제지만 언어와 문자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담고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최근 출현한 인공문자 유니글리프Uniglyph는 이 오래된 꿈의 또 다른 실험이다. 2024년 arXiv에 발표된 논문은 언어의 음절을 표기하는 범용 문자 체계를 제시했는데, 이 문자는 디지털 숫자판과 유사한 7-세그멘트 구조를 보이는 독특한 방식이다.
‘보편적 글자’를 지향한다는 뜻의 유니글리프는 다양한 언어를 아우르려는 시도이다. 음성과 기호 간 일대일 대응을 추구하고, 새로운 음소의 추가가 용이하며, 디지털 환경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음성과 기호 간 연관성이 없고, 직관성이 떨어져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문자가 난해한 기호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 실험적 프로젝트가 일깨워준다.
세계문자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한글이다.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로, 음운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합리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학습이 용이하다는 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확장성·적합성 역시 한글의 매력이다.
하지만 한글도 만능은 아니다. 우리글 초성·중성·종성의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음소들은 세상에 넘쳐난다. 현존하는 국제음성기호 체계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처럼 세계의 수많은 발음을 세밀하게 기록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니글리프와 한글은 서로 대조적이다. 전자는 보편성과 과학성을, 후자는 실용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한쪽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실험적 체계이고, 다른 한쪽은 역사가 실증하고 있는 실용적 체계이다. 어느 하나가 인류의 ‘유일한 문자’로 군림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질문은 여전하다. 인류는 정말 하나의 문자를 원하는가? 오히려 다양한 문자와 언어의 공존 속에서 더 풍요로운 문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세계문자의 꿈은 단순한 기술 표준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자의 의미를 묻는 원초적 질문이다. 유니글리프의 등장은 이 질문에 도전한 사건이며, 한글은 여전히 그 물음에 실질적 대안을 던지는 유력한 후보로 자리하고 있다.
올해는 이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9돌 되는 해다. 15세기 조선의 군주가 품었던 ‘백성을 위한 문자’의 꿈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의 '만백성'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천개의 강을 비추던 달빛, 세종의 월인천강지곡이 이제 온 세상을 비추는 달빛, 월인만강지곡이 되기를 노래하고 싶다.
유네스코가 2024년에 지정한 소멸위험 4단계그룹 언어 538개 중에는 제주어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다양성과 언어다양성이 다 같이 존중받는 지구 생태계가 되기를 바라며, 세종의 뜻이 월인으로 천강, 만강에 퍼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연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