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지 시인, 신작 시집 『계단에 앉아 있는 이야기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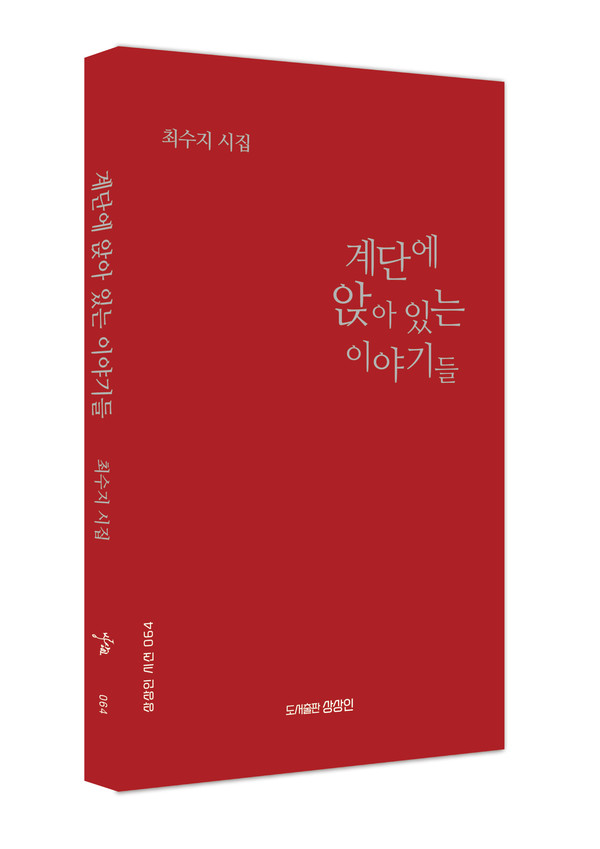

저 달
너도 그랬구나
태풍에 집 못 찾아간 명태 눈처럼 충혈된 그 사이사이 그래도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나를 막무가내 들썩이며 턱도 아니게 겁을 주네
-「따라온 달은 병원 창밖에 떠 있고」 부분
최수지 시인의 네 번째 시집 『계단에 앉아 있는 이야기들』이 도서출판 상상인에서 출간됐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고통과 우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것을 ‘가볍게 만들기’의 기술로 다룬다.
시집은 총 4부로 나뉜다. 1부 ‘바람이 나를 데리고 그 숲에 간다면’은 상처와 기억을 직면하며 ‘견딤의 기술’을 탐색하고, 2부 ‘틈 사이사이 별 쏟아붓는’에서는 우울과 번아웃을 유머와 이미지로 이행시킨다. 3부 ‘물어 온 소리 하나’는 공동체와 관계 맺기의 서정으로 나아가고, 4부 ‘붉다가 볼 가히 젖어 드는 눈가’에서는 새, 휘파람, 기도와 같은 상징을 통해 초월적 공감과 환대를 모색한다.
“가벼움은 회피가 아니라 체중 이동”이라는 비유처럼, 무거운 감정을 지우는 대신 다른 지점으로 옮겨 균형을 찾는 시적 몸짓을 보여준다.
대표작 「그 숲으로 가자 하니」에서 화자는 잘린 무의 촉감, 하옥계곡의 기별 같은 이미지로 상처의 원형을 불러내면서도, 측백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기억의 안내자로 배치한다. 무엇보다 “잘린 발목을 붙들고… 버티다 보면/ 발자국이 찍힌다”는 구절은 봉합이 아닌 견딤의 깨달음을 선명히 드러낸다.
이번 시집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함께 사는 세계’의 꿈으로 확장된다. 「우리들의 나무」에서 자작나무와 사이프러스는 공생의 은유로 서고, 「계단에 앉아 있는 이야기들」에서는 해체된 도시 공동체를 시적 화자가 다시 연결한다. 일상의 균열을 웃음과 유머, 그리고 환대의 언어로 재배치하며 공동체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전해수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멀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건네는 말처럼, 최수지의 시는 슬픔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젖은 마음’”이라고 평했다.
최수지 시인은 2001년 『한국예총 예술세계』로 등단했으며, 한국여성시 회장과 부산여류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그리운 이의 집은 흔들리는 신호등 너머』, 『손톱에 박힌 달』, 『달려도 녹지 않는 설국』 등이 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