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시인·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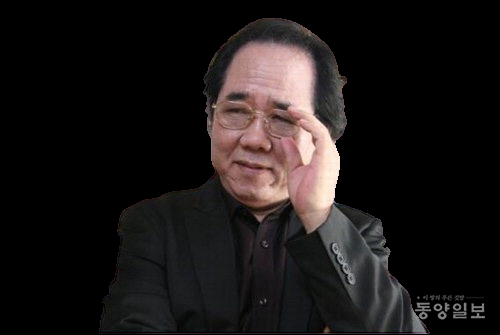
명절은 한때 ‘가족의 대이동’과 ‘주부들의 대장정’을 상징했다. 며느리들은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해물을 손질하느라 부엌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렸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상도 간소화되고, 가족들이 분담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고된 노동을 떠맡는 시대는 지났다.
명절 당일의 풍경 또한 크게 달라졌다. 아침부터 술잔이 오가던 모습 대신, 제사와 성묘가 끝나면 가족들이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조용한 시간이 이어진다.
몇 해 전 추석에도 그랬다. 추석날 낮잠을 자고 눈을 떴다. 아내가 내 쪽을 향해 잠을 자고 있었다. 잠결인지, 아니면 오랜만이어서 그랬을까. 눈, 코, 잎 모양 분명 40년을 넘게 살을 부딪치며 살아 온 아내의 얼굴인데 갑자기 낯설어 보이면서 까닭 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은 기억 속에 선명했다. 뽀얗고 윤기가 흐르는 피부, 웃을 때마다 번지던 싱그러운 기운, 무엇보다도 생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무심하게 흘렀다. 낮잠을 자는 아내의 머리밑이 희끗희끗해지고, 피부에는 주름이 드리워진 채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다.
아내도 분명 한 개체로서의 인간이다. 그런데도 나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밥을 해 주고, 빨래를 해 주고, 폭주하지 말라고 염려해 주고, 늦게 귀가를 하는 날이면 재미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오직 나라는 남자를 기다렸다.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 가장이 작가가 되겠다는 어줍잖은 꿈을 안고 불확실한 미래의 강가에서 사표를 내던졌을 때도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내 역시 글을 쓰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터인데 원망하는 기색도 없이 죽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은행을 그만두고 5년 동안은 아내의 말대로 ‘어쨌든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을 밥그릇에 죽처럼 말아 먹으며 살았다. 아내가 자식들의 학비며 끼니에 연연할 때, 나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줏값과 담뱃값에 연연하며 살았다. ‘이번 달은 보너스가 나오는 날인데.’ 아내가 문득 한숨을 길게 내쉬면 ‘백날 후회해봤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윽박질렀었다.
언젠가 냉기를 품은 초봄 바람이 사납게 불던 날은 냉이와 쑥을 뜯어 와 밥상에 올리며 시골 정취를 즐겼다고 웃기도 했다. 사실은 반찬이 없어 들로 나간 것이었지만, 내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아내의 늙은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이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나는 당연한 듯 사랑을 받기만 하며 살았고, 아내는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파듯 아프게 다가왔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아내가 눈을 떴다. 내 얼굴에 묻은 눈물을 본 아내는 놀라며 닦아 주었다.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여튼 남자는 평생 보살펴야 합니더. 돌아가신 어머님 꿈이라도 꾸신 게지예?” 나는 그 말에 쓸쓸한 웃음을 지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아내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물가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을지라도, 이제야 비로소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 풍경이 달라졌듯, 사랑의 풍경도 변한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서로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늦게서야 찾아오는 깨달음 속에 진짜 사랑이 있다. 명절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차례상 음식이 아니라, 결국은 가족과 함께 살아낸 세월의 무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