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국 청주시 서원구청 세무과 도세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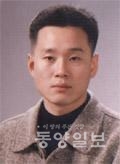
공정성, 투명성, 청렴, 참여, 효율성 등은 모든 공공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시민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고 있을까. 다수의 공공문서나 정책설명자료는 여전히 숫자와 용어, 추상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설득은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스토리다.
단순한 정책설명 대신 그 정책이 실제로 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인식은 달라진다. “복지급여가 확대됐다”는 수치보다, “어느 홀몸 어르신이 전기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더 오래 남는다. 스토리는 감정을 자극하고, 기억을 붙잡으며, 가치를 전달한다.
스토리텔링은 공직자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스스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우리는 수많은 행정절차와 시스템 속에서 일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변화다. 그 사람의 변화, 그 일상의 변화가 이야기로 연결될 때, 행정은 생명력을 얻는다.
스토리를 통한 행정 전달은 시민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업으로 어떤 동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 정책의 성과는 종종 통계에 갇히지만, 스토리는 그 통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신뢰를 만든다.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공직자는 ‘업무 중심’의 사고에서 ‘사람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문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그 글을 읽을 시민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과 감정으로 접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책 문구는 단순한 행정용어가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언어가 된다.
또한 스토리는 행정 내부의 동기 부여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어떤 정책이 시행됐고, 그 정책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직자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각종 회의자료가 전하지 못했던 ‘일의 의미’가 스토리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토리를 공유하는 조직은 자부심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조직이 된다.
다만 스토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행정에서의 스토리텔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의 기록’이어야 한다. 그 진정성은 시민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과 더 가까워져야 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스토리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짧고 강렬한 콘텐츠, 영상 기반 소통, SNS를 통한 참여형 이야기 구조 등은 행정이 스토리로 시민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 공직자는 이제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야기를 만드는 기획자가 돼야 한다.
행정은 숫자보다 마음을 움직일 때 더 큰 변화를 만든다. 그 마음은 결국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스토리의 힘을 통해 우리는 정책의 의미를 전달하고, 행정의 가치를 체감하게 하며, 시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줄의 이야기가, 시민의 신뢰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