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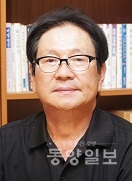
은유는 어두운 비유라는 뜻으로 암유(暗喩)라고도 한다, 숨기거나 가려 비밀스럽게 속에 넣어두려는 그늘 수사법이다. ‘수필은 난(蘭)이요, 학(鶴)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은유다. 이것은 ‘수필은 난(蘭)과 같고 학(鶴)인 듯하다’ 정도의 직유를 생략하여 신선한 생명감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에서 은유법으로 쓴 것이다.
나기황 시인은 여섯 번째 시집 '느낌표에게 묻다'를 내면서 “눈물은 내 시의 가장 오래된 은유다”라고 했다. 여섯 번째의 눈물들을 은유의 수사로 비밀스럽게 시집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물에 대해 "'눈물의 농도는 탁해지고 쓸데없이 염도(鹽度)만 강해진 탓이다. 시적 감흥도 희미해졌다.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미 출간한 다섯 방울의 눈물도 세속의 탁류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탄식한다.
문학의 숲길을 30년 동안 걸어온 그의 독백은 ‘내 시(詩)는 눈물이다’라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와 눈물’ 두 개념이 동행하고 있었으니, 시가 메마른 날에는 눈물이 그 뿌리를 촉촉이 적셔 시 나무에 새잎을 돋게 하였을 터다. 그러나 그는 눈물의 농도가 탁해졌다고 한탄한다. 고래로 시인의 탄식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묵상의 잠언이 어디 있었던가!
대체 좋은 시는 무엇인가? 무심하게 지친 생각을 생경하게 일으켜주는 것일까. 혹은 낯설고 힘든 나의 것들을 앞질러 가서 젖혀 보이며 “어서 와! 별거 아니야”라고 짚어주는 것일까.
다음 인용 시는 나 시인의 '아버지와 두발 자전거'다. “아버지는 바퀴 하나 없는 나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안간힘으로 페달을 밟아야/쓰러지지 않는다는 노동의 역학관계를/그땐 알지 못했다/월셋집 철대문에 자전거를 기대기까지/수없이 많은 가로등과 다리를 건너야 했던/가장의 무게를 그땐 알 수 없었다//꿈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생의 속도를 배우면서/아버지를 벗어나 아버지가 되기까지/필요로 했던 두발 자전거의 근력을/아버지만 알고 있었다//어느새, 부쩍 커버린 아들이/바퀴 하나를 버리고/두발 자전거를 타겠다고 한다//아들의 자전거를 잡아주면서/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멈출 수 없는 인생의 속도와/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의 무게를/말해줄 수 없었다//그저 자전거를 잡아주는 손에/힘을 주었다 놨다 할 뿐이다”
아들의 두발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그 옛날 자전거를 잡아주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다. 시인은 말하고 있다.‘안간힘으로 페달을 밟아야/쓰러지지 않는다는 노동’에 대하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시인도 아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인생의 속도와 그 무게를 말해줄 수 없었다. 지금 시인은 월셋집 철대문에 기대어 놓았던 아버지의 자전거를 기억하며 울고 있다.
삶이 영웅적인 사람은 시인이 되지 못한다.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밟히는 풀포기처럼 길가에 앉아 좌절한 나날들! 아무도 없는 시각마다 멍든 잎새를 몰래 펴 보이며 따뜻한 햇살을 그리워하는 존재, 그가 바로 시인이다. 그 길가에 민들레처럼 낮게 피어 해바라기꽃보다 큰 의미로 사람들 마음을 적시는 것이 詩다.
비록 잠언처럼 시 정신과 결합할 수 없는 산문 같은 시를 펴 놓고 통곡한다고 할지라도 나기황 시인처럼 세월 속에서 삶이 깊어지고 강폭은 넓어지는 진정한 시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인에게 웃음 섞으며 시집을 강매하던 여류 시인을 나는 기억한다. 발행 부수를 따지지 마라. 그냥 그대의 시집 속에 그대의 진정한 영혼을 묻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