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시인·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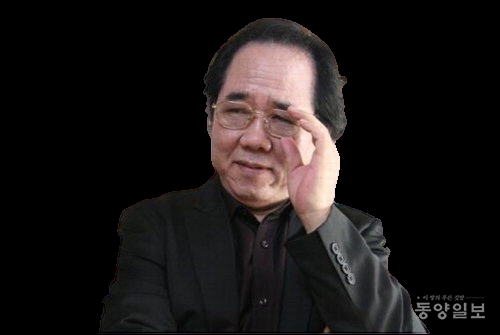
식물은 서리가 내리면 시들거나 색이 변하며 생육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감자, 고구마, 고추 같은 작물은 서리를 맞으면 조직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조절하거나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
서리는 보통 맑고 바람이 약한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잘 생긴다. 이러한 기상 조건에서 지표면의 온도는 공기 온도보다 더 낮아지고, 이때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바로 얼음 결정으로 변하면서 서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서리는 눈이나 비처럼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지면 근처에 응결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늦가을이나 초겨울의 계절 변화 신호로 여겨지기도 한다.
60년대에 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라면 설탕 알갱이처럼 서리가 내린 무밭에서 무를 뽑아 먹던 기억을 할 것이다. 요즘 세대는 무를 깍두기를 담그는 식재료 정도로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훌륭한 간식거리였다.
하굣길에 책보를 어깨에 비켜 매고 무밭으로 들어가서 팔뚝 보다 굵은 무를 쓱 뽑아낸다. 잔디나 나뭇잎으로 대충 흙을 털어내면 때가 새카맣게 낀 손톱으로 껍질을 벗겨낸다. 아니면 예전 개그프로에 나오던 갈갈이 삼형제처럼 이빨로 긁어서 껍질을 벗긴다. 무 윗대가리의 파란 부분은 단맛이 나서 웬만한 배나 사과보다 맛있다.
무를 배가 부르도록 먹으면 소화가 잘되지 않아서 방귀가 나온다. 방귀 냄새가 닭똥 냄새보다 지독해서 코를 막으면서도 깔깔거리며 웃기 예사다.
이때쯤이면 학교에서 겨울철 난로에 땔 나무를 하러 간다. 4학년 이상 전교생이 학교 근처의 산에 올라가 고주박이라 부르는 나무뿌리 썩은 것을 1인당 2개씩 구해야 한다. 고주박이는 뿌리 부분이라 결이 단단해서 난로에서 오랫동안 타오른다. 또, 싸리나무를 하러 가기도 한다. 싸리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어 창고에 가득 보관하며 일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내리면 서리가 내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요즈음은 유전과 관계없이 중학생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새치가 생긴다. 그 시절에는 50대에 접어들면 보편적으로 새치가 생기기 시작했다. 머리에 새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젊은 시절이 가고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징조다. 말 한마디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고, 행동거지도 절제를 하기 시작한다.
프로이드의 이론 중 ‘낯선 두려움’이라는 이론이 있다. 예전에 출간한 장편소설 <파두>의 주제이기도 한 ‘낯선 두려움’이라는 말은 친숙했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방어 기재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몸을 움츠리는 행동처럼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예를 들어서 내 몸처럼 사랑하던 사람과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 그 충격으로 뇌에 이상이 올 수가 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상상했던 것보다 덜 느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첫서리는 자연에 대한 낯선 두려움이다. 갑자기 날씨가 급강하하면 식물들이 얼어 죽을 것이다. 서리를 내려서 추위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 주면서 서서히 겨울 속으로 잠겨 들게 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서 ‘낯선 두려움’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자고 나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다. 충격을 누를 사이도 없이 또 다른 충격이 쌓이게 되는 현상 ‘트라우마 누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슬플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