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서 도시까지 기후의 징후를 찾아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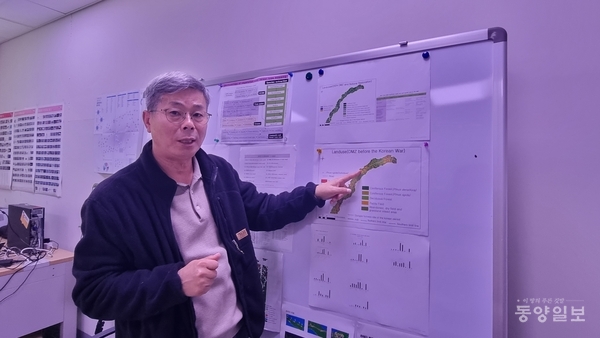
충남 당진 삽교천에서 태어난 김남신(59·사진)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장은 처음부터 학자의 길을 꿈꾼 사람은 아니었다. 한국교원대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닐 생각은 없었다. 그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사짓고 싶었어요”라고 첫 말을 꺼냈다. 그는 중간고사만 치르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 후 순수학문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시작된 학문의 여정은 30년 넘게 생태와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길로 이어졌다. 이후 논문 140여편, 저서 8권을 써내며 생태 환경 연구자로 자리잡았다.
그의 연구는 공간분석과 초분광 영상, 인공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최첨단 도구를 기반으로 한다. 생태 변화와 기후위기의 징후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지리산과 한라산에서 구상나무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하며 산림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한 연구자 중 한 사람이 됐다.
2008년 발표한 해수면 상승 관련 논문은 100년 뒤 한국 해안의 물리적 변화를 예측했고, 이는 해안도시 정책 연구의 기반자료로 활용됐다.
당시 환경부는 그의 연구결과를 눈여겨봐 신뢰했고, 낙동강생물자원관 착공식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시선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았다. CNN 뉴스에서 북한 주민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왜 저렇게까지 됐는지’ 알고 싶었다. 이후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며 북한 산림 훼손과 환경 붕괴의 원인을 추적했다. 15년간 이어진 북한 연구는 단순한 학술 작업을 넘어, 생태가 무너지면 인간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취약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김 실장은 기후위기는 먼 곳이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관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도시 열섬현상, 사라지는 참새, 남아 있는 곤충과 같은 눈앞의 변화가 기후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증거라고 언급한다.
그의 연구는 늘 일상 감각과 과학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는 초분광영상과 라이다 기술을 결합한 자동 식생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몬순 지역처럼 나무 종류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도 식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에게 생태 보전의 핵심은 결국 교육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공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공유생태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동네 생물 종 변화를 확인하고 생태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생태정보 앱’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생태를 아는 만큼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생태계 복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환경부와 생태원은 그의 제안과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훼손지 복원사업과 도시생태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생태 보존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원칙을 강화하고,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 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연구는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됐다.
30년 넘게 생태와 기후변화 연구에 몸담아 온 그는 3년 후 은퇴를 앞두고 있다.
김 실장은 “기후와 생태 연구는 이제 충분히 했다”며 “은퇴하면 연구보다 제 2의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오랫동안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해왔지만, 그가 남긴 연구 성과는 한국 생태학계의 중요한 축으로 남아 있다.
서천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