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전 중원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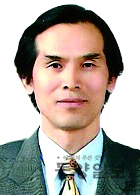
첫째, 두만강유역에서 자기시대에 충성하다가 순국한 사람의 일화가 있다. 다음은 김정구(1916~1998)가 부른 〈눈물젖은 두만강〉에 관련된 사연이다. 1933년 이시우(1913~1975)는 유랑극단 “예원좌”를 이끌고 두만강유역인 도문(圖們)의 만춘여관에서 숙박하는데, 옆방에 투숙한 여인이 통곡한다. 주인이 말하기를, 남편을 찾아 10년을 떠돌다가 이곳에 와서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것이라 했단다. 문창학(文昌學1888~1923)의 부인인 “김증손녀”라고 한다.[유튜브], [신문]. 함북 온성출신 독립운동가 문창학은 1919년 3·1운동에도 참여했다. 1920년 대한독립군결사대에 가입하여, 1921년 대원들과 “함경북도 신건원주재소(新乾源駐在所)”를 습격하여 일본경찰을 살해하고 주재소숙사를 파괴했다. 훈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가 1922년 밀정의 신고로 체포되어 1923년 서대문형무소에 사형당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둘째, 김용호(金用浩)가 작사하고, 이시우가 작곡하고 김정구가 노래하여, 1938년 OK레코드사에서 발표했는데, 일제가 민족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매금지시켰다. 문창학의 항일행적을 널리 알려 항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래 가사로 작사한 김용호와 이를 작곡한 작곡가 이시우도 그 시대에 충성했다. 김노규는 두만강가의 종성에 살면서 국경과 국방의 중요성을 두만강구곡시에 담아 오늘에 알 수 있게 했으니, 문학으로 충성했다.
셋째, “제7곡 鍾城古渡:종성의 옛나루이다.” 聽鍾移棹向孤城, 豐樂西東世太平[西豐東豐之水南來].古有市胡歸去渡,波心每欲洗腥行.[市撤歸時, 自鏈城渡江.今罷.]“종소리 들으며 외떨어져있는 성을 향해 노저어 가는데,풍족하고 안락하니 동서로 세상이 태평하네[서쪽이 풍요롭고, 동쪽이 풍요로운 건, 물 남쪽으로부터 오네]. 예전에 시장이 있었는데 어찌 건너돌아갈꼬? 물속에 매번 비린내를 씻고 건너고자 하네.[청나라 시장을 철수하고 돌아갈 때, 연성(鏈城)으로부터 강을 건넜다. 지금은 폐해졌다.]”
넷째, 종성에 예전에 청나라가 시장을 운영했는데, 지금 철수하고 돌아갔다. 청나라의 제재를 받지 않고 종성시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이 관할하는 땅에 중국의 흔적을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읊었다. 김노규는 이렇듯 자기 고향의 외떨어진 성의 변천에 대한 사실을 주목하고, 아울러 그 땅의 풍족하고 안락한 모습을 노래했다.종성(鍾城)은 함경북도 종성군에 있는 국경도시로 중국 간도지방과 인접해 있으며 두만강 오른쪽기슭에 있는데, 군청소재지다. 다섯째, “제8곡 會寧河道 회령의 물길을 보자.”幹木河來道會寧,後鰲前鳳局中靈[鰲山在北, 五鳳山在南].何時帝塜今茲在, 遺恨應多趙宋廷.“알목하는 회령으로부터 길이 이어지고, 뒤에는 오산 앞에는 오봉산이 있으니, 중앙의 신령이 되는 형국일세[오산은 북쪽에 있고, 오봉산은 남쪽에 있다]. 어느 때에 황제의 릉(陵)이 지금 이곳에 있었나? 남은 한(恨)은 응당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조정의 자취가 많이 있는 거라네[송나라 황제의 릉이 있었다고 일컬어진다] ”위 시에 간목하(幹木河)는 알목하(斡木河)가 옳다.김노규의 문집 《학음집(鶴陰集)》에도 그렇게 표기돼있는데, 문집을 편찬하기 위해 글씨를 쓴 사람이 잘못 썼다.
여섯째, 김노규는 회령 알목하에 송나라 황제 조광윤(趙光胤 927~976)의 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곳이 중국의 영향권이 있었던 지역으로, 중국의 옛자취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국이 알면, 언제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것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김노규는 전설까지 중국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할 점이 있다면, 이 점을 유념하고 망각하지 않고 경계하기 위해 〈두만강구곡잡영〉에 담았다.
일곱 째, 김노규는 학문과 문장으로 자기시대에 충성을 다한 참 유학자요 애국지식인이다. “언제나 끊임없이 각자 자기분야에서,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교와 동문의 영광을 위해, 고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인류와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충성을 다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