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큰 건물엔 일본 군대가 기관총 앞세우고 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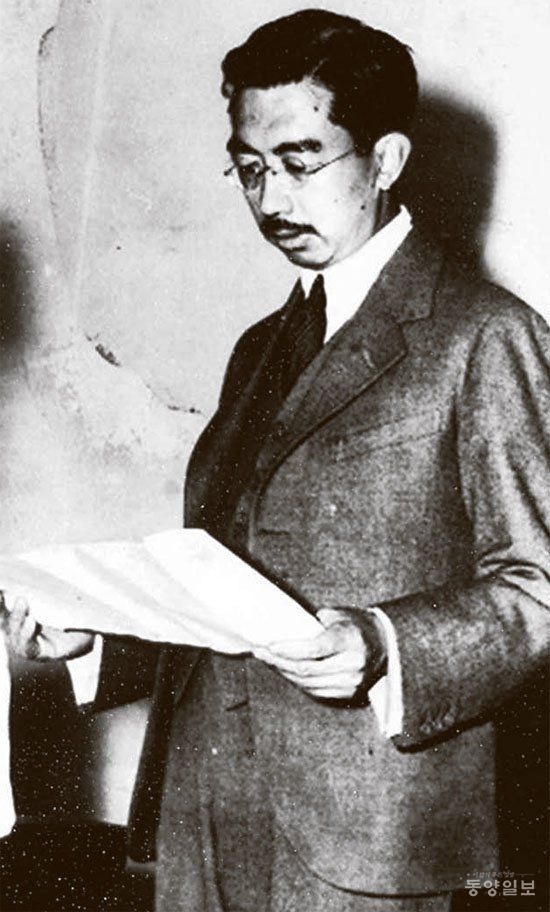
◆ 일본군막에서 탈영 감행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8월 15일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한 뒤에도 조선인 학도병의 귀환과 관련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점호만 계속했다. 조선 학도병들은 쉬쉬하며 정보를 나누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즉각 돌려보내지 않고 조선 학도병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뜻을 모아 임의로 귀국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장교는 영문을 임의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갑간(甲幹) 출신인 염정훈과 을간(乙幹) 출신의 정병회, 그리고 상등병인 안동준, 이렇게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게 됐다.
결국 안동준은 염정훈, 정병희와 함께 8월 30일 ‘탈영’을 감행했다. 하루 빨리 조국에 돌아가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 편지만 챙겨 정문을 유유히 통과
그날 일행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 내무반에 있는 소지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소중히 간직했던 편지 몇 통만 챙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문을 통과했다.
곧바로 나고야 역으로 가서 시모노세키 행 기차를 탔다.
시모노세키역 인근은 사람들로 들끓었다. 한 달 가까이 부산가는 배가 불통이어서 승객들의 발이 묶여 있었던 탓이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운행을 재개한다는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환호성이 터졌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고야 역에서 부친 수하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일행은 결국 짐을 포기했다.
군복이 힘이요 계급이 깡패라고, 군복을 입은 일행은 장교와 하사관의 계급장 덕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배를 탈 수 있었다.
◆ 고향 대신 서울행 택한 중산
나고야를 떠나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한 안동준은 부관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뒤 경부선을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부모님과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가려면 조치원역에서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들어야 할 것이 있었다. 9월 초 서울에서 있을지도 모를 건국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해야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국 광복을 맞아 민족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운영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하이에 살던 매형 최상옥(崔相玉)으로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 미국에서 이승만이 단파 방송을 통해 독립운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9월 1일 도착한 서울의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 서울엔 아직까지 일본군이 상주
안동준은 1945년 9월 1일 새벽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서울은 그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일본이 망한 지 보름이나 지났건만, 대로변에 우뚝 선 큰 건물엔 아직까지 일본 군대가 기관총을 앞세우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니 자신 또한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
서글픈 생각이 밀려왔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현동으로 갔다. 인현동은 손위 처남 조관식씨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나고야에 있을 때 인현동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받았던 터였다.
한나절 걸려 처남집으로 찾아갔지만, 처남이 시골로 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날 하룻밤을 묵었지만 오래 있을 처지가 안 됐다.
김명기 기자 demiankk@dynews.co.kr

